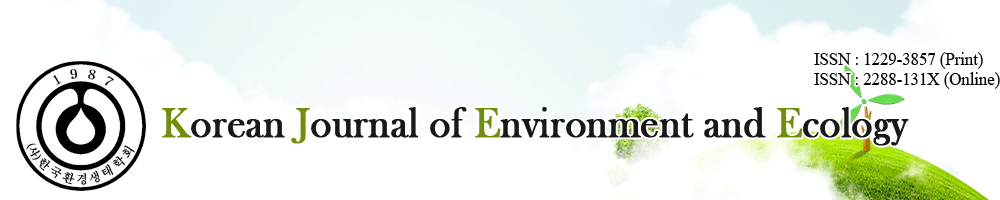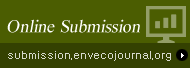서 론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해, 차량 이동이 가능한 도로는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Kazama et al., 2021). 그러나 보호지역 관리 목표의 핵심은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안정성 증진에 있는 만큼, 산림 내 도로 조성은 보호지역의 핵심 목표와는 반대로 여러 생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산림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생태계를 파편화시키고 생물 서식지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서식지 단절을 초래한다. 또한 도로 개발 과정에서 벌목, 성토, 절토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된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켜 외래종 침입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Doody, 2013;Forman et al., 2003). 또한, 도로가 계곡을 지날 때 생기는 낙차공은 계곡 생태계의 단절을 유발하여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규모 산림에만 서식하는 산림 내부 종의 경우, 도로에 의해 서식지가 파편화되면 일반 종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Newbold et al., 2014; Morante-Filho et al., 2018; Galán-Acedo et al.,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 지역 내 도로의 밀도와 위치는 산림 생태계 건강성에 중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와 실제 이용 현황 간의 괴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국제 보호지역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중에서도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각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관리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호지역 내 도로 개설과 같은 인위적 간섭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인 기준이 된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 화두는 보호지역의 확대에 있다(An, 2023). 이를 위해 1992년 제4차 세계공원 총회(The IVth IUCN World Parks Congress)에서는 2000 년까지 각 생태계의 최소 1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여, 보호지역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4년 Brooks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육상 보호지역이 지구 전체 육지의 12%에 달했음에도 일부 생태계 유형의 보호 비율은 채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구 전체 생태계 보호 노력이 미흡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논의가 최근들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총회(CBD COP 10)에서는 2020년까지 육상 및 내수 지역의 17%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했으며, 2022년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 비율을 각각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강력한 국가 간 공동 노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보호지역의 양적・질적 확장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최근 빠르게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1)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상 보호지역 면적은 국토 육지 면적의 약 17%에 해당한다. 보호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간적 면적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만, 질적 관리와 보전 상태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적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5,000여 곳에 달하는 보호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과 그 적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지역 내 인위적 간섭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도로 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육상 보호 지역에서는 도로 밀도가 생태계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호지역 내 도로 현황은 보전 관리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보호 목적 에 반하는 이용 압력이 도로의 밀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산림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는 해당 보호지역 내에 건설된 모든 도로가 포함되며, 특히 이동량이 많은 도로일수록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도로 밀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산림도로 밀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Japanese Forest Service, 2023) 산림경영에 활용되는 산림도로의 밀도를 ‘임내노망밀도(林内路網密度)’라 정의하며, 여기에는 국도와 지방도(도도부현도)를 포함한 공도, 농업을 위한 농도, 산림 경영 및 작업도로인 임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도로가 산림 외부 또는 경계 인근에 위치할 경우, 해당 도로의 편입 여부나 도로의 위치 표기 방식, 예를 들어 산림과 중첩되거나 분리 표기되는 경우 등의 경우 산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산림 외부에 위치한 도로들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스트리아는(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Regions and Water Management, Austria, 2023) 상대적으로 명확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숲 내부뿐 아니라 숲 가장자리로부터 75m 이내에 위치한 공공도로, 사유도로 등 차량 이동이 가능한 모든 도로를 밀도 산정에 포함한다2). 숲 가장자리와 인접한 도로는 자연스럽게 숲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게 되므로 이용 측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전제하는 산정방식이다. 아울러, 공간데이터 측면에서 점과 면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불합리한 오류를 모두 상쇄할 수 있어 효과적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호지역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 보호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조성된 도로 밀도를 분석하여,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자 하였다. IUCN은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호 목표에 따라 보호지역을 6개 유형(Ia~VI)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 방향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있다. 인간의 접근 및 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Ia와 Ib는 강력한 접근 통제를 요구하는 보호지역이며, 이후 유형 Ⅱ,Ⅲ → Ⅳ,Ⅵ → Ⅴ의 순서대로 접근 및 이용 측면의 허용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보호유형 Ⅴ지역의 경우 지속가능한 자연관광 및 휴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인위적 접근성이 높은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Dudley, 2008). Newbold et al. (2014), Morante-Filho et al. (2018)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지역 내 도로 밀도가 증가할수록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orman et al. (2003)은 도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단절시키고, 로드킬 위험을 증가시키며, 외래종 유입과 서식지 변형을 촉진하는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보호지역의 관리 강도 측면에서 도로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보호지역의 자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보호유형일수록 도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지역 내부 및 인접하여 조성된 도로는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규모를 높이는 만큼 도로밀도는 보호의 효과성과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보호지역 및 인접하여 조성된 도로의 밀도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각 보호지역 유형이 해당 유형의 관리목표에 부합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객관적 지표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유형별 보호지역 내 도로 밀도를 분석하여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내 인프라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보호지역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
IUCN의 보호지역 유형 구분은 국제적 비교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며, 국가 간 보호지역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6(+1)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Phillips, 2007). 지구 전체의 보호지역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전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가 UNEP와 IUCN이 공동으로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orld Dadabase on Protected Areas; WDPA)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보호지역 유형을 자국의 법률 또는 관습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WDPA 등재를 위해서는 각각의 보호지역에 대해 국제표준의 보호지역 유형 6(+1)개 중 하나를 설정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역 유형의 설정은 각 국가가 스스로 선택한다. 우리나라 또한 WDPA에 등재하는 모든 보호지역에 대해 IUCN 기준 보호지역 유형을 설정하여 등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 지역은 IUCN 기준에 따라 Ⅰb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과, 아직 보호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자연공존지역 (Other Effective Conservation Measures; OECM)을 포함하여 총 7개 유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1b 유형은 자연생태계가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대규모 면적의 원시 자연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유형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말 기준으로 WDPA에 등재된 국내 모든 보호지역 중 산림지역에 포함된 보호지역을 추출하여, 각 유형별로 도로 밀도를 산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산림지역 경계는 1:25,000 축척의 임상도를 사용해 산림 외 곽경계를 추출하였다. 보호지역이 산림 외의 다른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산림 경계 내 공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보호의 목적과는 달리 도시 전체가 보호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이 있어 해당 보호지역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다만, 임상도에는 민간인통제선 주변과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산림경계는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자료3)를 사용해 보완하였다. 도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4) 에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중심선 자료와 산림청의 임도시설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차량 이동이 가능한 모든 도로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신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공개된 산림청 임도 자료와 2023년 9월에 공개된 국토교통부 도로 중심선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국내 도로를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청 임도를 포함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부 도로와 등산로가 혼재된 소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유형과 임도 공간정보를 중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로 데이터에서 임도를 제외한 차량 통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도로는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Hong and An, 2024).
산림도로 밀도의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산림연구원은 산림도로 밀도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산림 내부 도로, 둘째는 산림 경계부 도로, 셋째는 산림 경계로부터 75m 이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5).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자료 구축 방식에 적합한 오스트리아의 세 번째 방식, 즉 산림 경계로 부터 75m 이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하여 산림도로 밀도를 산정하였다. 이는 산림과 인접한 도로가 보호지역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간정보의 부정확성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도로중심선의 경우 도로가 산림과 연접한 경우 산림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산림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산림을 도로에 의해 구분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인접 거리 이내의 도로를 포함하는 방식은 공간정보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공간 분석은 임상도에서 1차로 추출한 산림의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산림 경계선을 작성하고, 이를 보호지역 유형별 경계와 중첩하여 보호지역과 산림이 중첩되는 구역을 추출하였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각각 하나의 보호 지역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지역 유형이 중첩되어 지정된 경우 또한 매우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중첩지정된 보호지역은 해당 유형 분석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후 각 보호지역 경계로부터 75m 이내에 위치한 도로를 분리한 후 도로 길이를 합산하여 산림 보호지역 유형별로 해당 보호지역 면적에 대한 도로밀도를 산정하였다(Hong and An, 2024). 분석에는 EPSG:5187 좌표계와 지구 곡률을 고려한 geodesic 방식을 적용하여 m 단위로 적용하여 보호지역 면적은 ㎡로, 도로 길이는 m로 산정하였다. 공간정보 분석은 QGIS와 ArcGIS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보호지역 유형별 현황
2024년 12월 기준, KDPA에 등록된 우리나라 육상 보호 지역은 총 1,748개소로, 면적은 약 25,733.56㎢에 달한다6). 이를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a 유형은 ‘엄정한 자연보호구역(strict nature reserve)’으로, 과학적 연구와 환경 모니터링 외에는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이 제한되는 보호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천연보호구역과 해앙수산부의 환경 보전해역이 이에 해당하며, 총 15개소, 2,338.37㎢가 지정되어 있다. Ⅱ 유형은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생태계 보호와 동시에 환경교육과 비소규모 관광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며, 현재 17개소, 6,219.77 ㎢가 이에 해당한다. Ⅲ 유형은 ‘천연기념물 또는 특정 자연 유산 보호지역(natural monument)’으로, 특정한 자연 지형· 지질 또는 생물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24개소, 2.62㎢ 가 지정되어 있다. Ⅳ 유형은 ‘서식지/종 보호구역(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으로, 특정 생물종 보호와 관리를 중점으로 하며, 대부분의 보호지역 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는 1,146개소, 12,559.50㎢가 지정되어 있다. Ⅴ 유형은 ‘경관 보호구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과 전통적 토지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며, 217개소, 2,492.41㎢가 지정되어 있다. 자연공원과 명승, 해양보호구역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Ⅵ 유형은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지역(protected are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으로, 생태계 보전과 함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당하며 329개소, 17,782.96㎢로 보호지역의 약 43%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WDPA에 등재된 보호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1/25,000 축척의 임상도를 사용해 산림 경계를 추출한 결과, 산림 경계 내 보호지역 면적은 총 1,472,713ha 로, 이는 전체 육상 보호지역 면적에서 산림이 약 8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는 산림 면적이 넓고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보호지역에서 산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Kim(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각각의 관리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이 여러 보호지역 유형에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산림에 지정된 보호지역을 각 유형별로 모두 구분하여 면적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중복지정된 보호지역의 경우 중복되어 면적에 산정되었다. 이에, 산림 보호지역을 유형별로 모두 합산할 경우 총 면적은 2,395,556ha에 이르렀다. 이는 산림 보호지역에서 중복 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보호지역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중복하여 분석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분석 면적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보호지역 유형별로 산림에 지정된 면적을 살펴보면, 유형 Ⅵ(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지역)가 1,008,092ha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일괄적으로 유형 Ⅵ로 지정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 Ⅳ(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가 801,581ha 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형 Ⅵ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과 단일 보호지역으로 가장 넓은 면적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유형 Ⅱ(국립공원)는 324,060ha로,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비교적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Ⅲ(천연기념물) 지역은 58ha로 매우 작은 면적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한편, 2023년 12월 국내에서 처음 등재된 OECM 지역은 총 4개소로, 7,295ha의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2. 보호지역 유형별 산림 도로 현황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모든 도로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면리도, 미분류도로, 소로의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간정보를 구축ㆍ제공하고 있다. 이 중 소로를 제외한 8개 도로 유형과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 보호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총 길이를 도로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는 소로의 경우 산림 내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비교적 폭이 넓은 등산로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임도 정보를 활용 하였다. 산림 보호지역 내 각 보호지역 유형별 도로 길이와 밀도는 아래의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산림 보호지역에서 가장 많이 조성된 도로 유형은 군도로, 총 길이는 약 17,029km에 달하며, 밀도는 7.1m/ha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도로가 10,722km로, 밀도는 4.5m/ha를 기록했다. 면리간 도로의 경우 총 8,742km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보호지역 내 밀도는 3.6m/ha로 확인되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임도는 보호지역 내에서 총 4,695km가 조성되어 있으며, 밀도는 2.0m/ha 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유형별 도로 밀도 분석 결과, 일부 보호지역에서는 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도로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호강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유형으로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가 기본 전제가 되는 보호지역 유형 Ⅰa의 도로 밀도는 관리강도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52.6m/ ha에 달해, 상대적으로 보호 강도가 낮은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유형 Ⅰa 다음으로 보전 강도가 높은 유형 Ⅱ의 도로 밀도는 5.3m/ha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이뤘다.
주로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유형 Ⅲ(천연기념물 지역)의 도로 밀도는 43.4m/ha였으며, 이는 보호지역과 인접한 도로가 많이 조성된 결과로 판단되었다.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Ⅵ 역시 높은 도로 밀도를 보였는데, 약 29.1m/ha로 확인되었다.
IUCN의 보호지역 관리 기준에 따르면 자연성 및 보전강도는 보호지역 유형 Ⅰ→ Ⅱ,Ⅲ → Ⅳ,Ⅵ → Ⅴ의 순서대로 낮아지게 된다. 보호지역 내부 및 인접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 자연성을 낮추고 이용강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만큼 도로밀도는 보전강도와 반비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 유형별 도로밀도를 낮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Ⅱ → Ⅳ → Ⅴ (→ OECM) → Ⅵ → Ⅲ → Ⅰa 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어 보전강도의 순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유형 Ⅰa는 학술적 접근조차 신중하게 해야 하는 높은 보전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호지역 유형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도로밀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유형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Ⅰa 유형으로 지정된 지역이 실제 보호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보호지역 유형 Ⅰa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고립된 소규모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규모 보호지역이 유형 Ⅰa로 등록되면서 도로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안가에 접한 육상지역을 일괄적으로 보호지역에 포함하고 있는 환경보전해역을 유형 Ⅰa로 등록한 것이 크게 작용 하였는데, 예를 들어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과 득량만 환경보전해역은 해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연안 산림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산림지역의 높은 도로 밀도가 전체 Ⅰa지역의 평균 도로밀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환경보전해역의 경우, 높은 이용 밀도와 함께 이미 개발된 바닷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유형 Ⅰa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보호지역 유형의 재조정 또는 해역과 육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유형으로 재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Ⅰa유형과 아울러 보전강도와는 상이하게 높은 도로밀도를 보이고 있는 Ⅲ유형 또한 개별 보호지역별로 관리특성을 살펴보고 유형의 재조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종합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산림경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임도 밀도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Cha and Cho, 1994;Jung et al., 2005;Park and Kang, 2010). 이들 연구에서는 벌목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 밀도를 최소 5.12m/ha에서 최대 14.01m/ha로 제시하면서, 산림도로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로 조성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경우, 임목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림경영이 아닌 자연생태계 보전이 주된 목적을 지니는 지역이므로, 경영 목적 산림에 비해 도로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전체 평균 도로 밀도는 17.1m/ha로, 이는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적정 도로 밀도를 이미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산림이 아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조차 도로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파편화 및 교란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생생물 서식지의 손실, 변형,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교란은 생물다양성 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Maxwell et al., 2016). 도로의 복원은 자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캐나다 북서부 산림지역에서 진행된 산림도로의 복원 연구는 도로 복원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Lacerte et al., 2022).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산림 도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2001년에는 국유림 약 1/3 면적에서 새로운 산림도로 건설과 벌목을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통해 신규 산림도로 조성과 벌목을 규제하고 있다7).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산림도로 축소와 산림의 생태적 복원이 산림 관리에서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림 도로 복원정책은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산림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보호지역 내 산림도로는 현재 자연생태계의 안정적 관리를 어렵게 할 정도로 과밀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들 도로는 보호지역 내에서 훼손된 생태계의 대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채택된 23개 실천목표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산림 보호지역 내 도로 밀도를 낮추기 위한 도로의 복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도로 밀도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내 불필요한 도로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복원하는 정책이 생태계 건강과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면서, 국제적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형구분이 실질적인 관리상태와 관리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보호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 일반인의 이용을 현실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호지역의 보전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보호지역 관리목표의 조정 및 도로를 포함한 훼손생태계의 적극적인 복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도로 밀도 관리 기준을 정립할 경우, 보호지역의 생태적 기능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