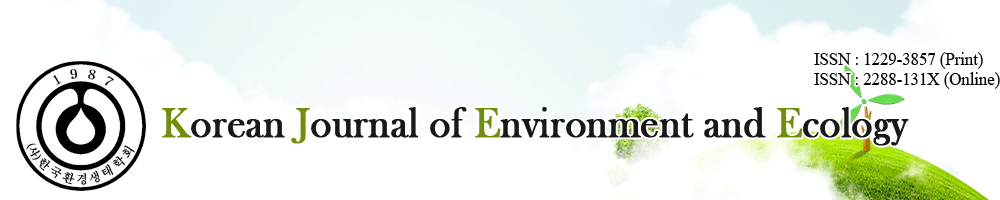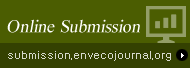서 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자연공원 법」 제17조3에 의해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총 2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신규 지정된 팔공 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은 제2차 보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팔공산국립공원은 도립공원에서 2023년 12월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현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립공원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생 및 식물군집구조 등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이 필수적이나, 팔공산국립공원은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팔공산국립공원 중 칠곡 가산산성 일대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구분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되며, 「국가유산법」제3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보전의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칠곡 가산산성은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리지구 중 하나인 가산지구 내에 분포하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진 성으로, 병자호란 이후 가축 및 신축되어 성벽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Kim and Kwak, 2018). 1971년 국가유산(舊 문화재)으로 지정되어(국가유산청, 20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2013년 성곽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곽의 조사 및 발굴을 통해 복원을 추진 중이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국가유산법」의 시행에 따라 사적으로 분류되는 칠곡 가산산성은 문화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국가유산법」제3조에 의해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칠곡 가산산성은 경북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조선시대 산성에 관한 연구(Kim and Kwak, 2018)가 진행되었다. 자연자원 대해서는 칠곡 가산 암괴류의 자연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12), 가산의 관속식물목록에 관한 연구(Yang et al., 2020), 가산 습지를 중심으로 한 식물상 연구(Park et al., 2015)와 팔공산 국립공원예정지 일대의 하계 곤충상에 관한 연구(Byeon et al., 2014)가 진행된 바 있으며, 국립공원연구원에 의해 2014년과 2021년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가 진행되었다. 2014년 자연자원조사에 따르면 칠곡 가산산성 일대의 잠재 자연식생은 온대림의 천이극상 수종인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군락으로 예측하고 있다. 칠곡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산성으로서 성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식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팔공산국립공원 내 칠곡 가산산성 일대는 성곽의 관리 및 문화유산 발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양답압과 식생 훼손 등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면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 칠곡 가산산성 일대의 자연자원 보호와 복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생연구가 미비한 칠곡 가산산성 일대의 식물군집구조 분석을 통해 산림식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팔공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팔공산 국립공원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칠곡 가산산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칠곡 가산산성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에 위치하며, 조사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임상도 자료(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3)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탐방로를 따라 가산산성 외성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어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96개 조사구를 설치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 본 조사는 2024년 7월에 수행되었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식생 및 환경요인 조사
식생조사는 방형구법을 활용하여 숲 내부에 10m×10m (100㎡) 크기의 조사구를 설치하였다. 수관의 위치에 따라 가장 상층부에 수관이 위치하는 교목층, 수고 2m 미만인 수목을 관목층, 교목층과 관목층 사이에 분포하는 수목을 아교목층으로 구분(Kang et al., 2020)하여 수관층위별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방형구 내에 분포하는 목본 수종을 대상으로 수목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였으며, 관목층은 10m×10m(100㎡) 방형구 내 가장자리에 5m×5m(25㎡)의 소방형구를 설치하여 수관폭(장변×단변)을 측정하였다. 수관층위별 평균수고와 식피율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지의 환경요인을 파악하고자 해발고, 사면향, 경사도, 지형구조(계곡부, 사면부, 능선부)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식물군집구조 조사
식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각 수종의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고자 수관층위별로 상대우점치를 분석하였다. 상대우점치는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상대밀도+상대피도)/2로 계산한다. 또한 개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관층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값인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를 (교목층 I.P.×3+아교목층 I.P.×2+관 목층 I.P.×1)/6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식물군락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96개 조사구를 TWINSPAN에 의한 군집분석(classification analysis)(Hill, 1979b)을 실시한 결과 8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군락을 그룹화하여 식생구조를 파악하였으며, DCA ordination (Hill, 1979a)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락의 분포 특석을 파악하였다. 군락 간 유사도지수를 파악하였으며, 각 군락의 종 구성을 알아보고자 Shannon의 수식(Pielou, 1975)을 활용하여 종다양도(Species Diversity, H′), 균재도(Evenness, J′), 우점도(Dominance, D), 최대종다양도(H′max)를 계산하였다. 또한, 단위면적(100㎡) 당 종수 및 개체 수를 파악하였으며, 식생의 수령 및 임분동태를 파악하고 자 흉고직경급별 분석을 실시하여 식생천이 양상을 추정하였다(Harcombe and Marks, 1978).
결과 및 고찰
1. 기후
칠곡 가산산성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북위 36° 1′~36° 3′, 동경 128° 34′~128° 36′의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평적 산림대를 기준으로 온대 기후대에 속해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가산산성이 있는 팔공산국립 공원의 한국 식생기후 분포도는 온대북부 낙엽활엽수림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20). 본 연구대상지인 칠곡 가산산성의 기후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 기상관측소의 30년(1994~2023)간의 가상자료를 분석한 결과(Table 1), 대구는 연평균기온 14.5℃, 최한월평균기온 –3.5℃, 온량지수 122.2℃, 한랭지수 –7.9℃의 온도조건과 1,062.4㎜의 연평균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온대 북부 낙엽활엽수림(온량지수 45~85)보다 온대남부 낙엽활엽수림(온량지수 >100)이 분포하기 적합한 식생기후로 나타나 기존 문헌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식물군집구조
1) 군락분류 및 유사도지수
칠곡 가산산성 내 96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TWINSPAN 기법을 이용하여 classific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2). 그 결과, Level 1에서는 서어나무, 소나무, 쪽동백나무가 출현하는 그룹(Division 2, -)과 줄딸기가 출현하는 그룹 (Division 3, +)으로 분리되었다. Level 2에서 Division 2(-)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쇠물푸레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Division 4, -)과 당단풍나무와 서어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Division 5, +)으로 분리되었으며, Level 2에서 Division 3(+)은 물푸레나무와 줄딸기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Division 6, -)과 느티나무, 으름덩굴, 비목나무, 아까시나무, 청가시덩굴을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Division 7, +)으로 분리되었다.
TWINSPAN기법을 이용한 군집 분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분류가 진행된다. 그 중 해발고와 토양습도가 군집 분류에 중요인자로 보고된바 있으며(Lee et al., 1991), 방위가 분리의 중요인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Lee et al., 1990). 본 연구에서 Division1의 구분은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생육하는 서어나무(Choi, 2004;Jo, 1993)와 소나무(Kim et al., 2008)가 출현하는 그룹 (Divison 2, -)과 산록 및 계곡부에서 자생하는 줄딸기 (Korea National Arboretum, 2025)가 출현하는 그룹 (Division 3, +)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 토양습도가 군집 분리의 중요인자로 파악되었다. Level 2의 Division 2는 내 음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상수리나무, 쇠물푸레나무가 출현하는 그룹(Division 4, -)과 내음성이 강한 서어나무와 당단풍나무가 출현하는 그룹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 출현 수종이 가진 내음성에 의해 군집이 분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나무는 내음성이 약한 특성으로 2차천이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일시적으로 우점하는 식생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and Jang, 1995), 서어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천이 극상수종으로 내음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다(Hori and Tsuge, 1993). 당단풍나무는 낙엽활 엽소교목으로 내음성이 강한 생육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교목층 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란다(Choi, 2008).
Level 3에서 Division 4(-)는 졸참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Ⅰ)과 쪽동백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Ⅱ)으로 분리되었으며 Division 5(+)는 철쭉을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Ⅲ)과 비목나무,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Ⅳ)으로 분리되었다. Division 6(-)은 물오리나무의 출현유무에 따라 군락 Ⅴ와 군락 Ⅵ으로 분리되었고, Division 7(+)은 밤나무, 아까시나무, 담쟁이덩굴을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Ⅶ)과 고로쇠나무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 (Ⅷ)으로 최종 분리되었다.
TWINSPAN기법에 의해 분류된 8개의 군락을 ordination 분석(Orloci, 1978) 중 DCA기법을 활용하여 조사구를 배치 하였다(Figure 3). 그 결과 제1축과 제2축의 eigenvalue가 각각 0.734, 0.303으로 4개축 전체 합 1.464의 70.8%에 해당하여 total variance에 대한 집중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1축과 제2축을 기준으로 조사구를 배치하였다. 제1축을 기준으로 군락 Ⅰ~Ⅳ과 군락 Ⅴ~Ⅷ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TWINSPAN의 결과와 동일하게 Division 1의 군집 분류 인자인 토양습도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예측되며, 선행연구의 DCA 제 1축에 배열된 분리 상태 현상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Lee et al., 1991).
제2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군락 Ⅰ과 군락 Ⅳ, 군락 Ⅵ과 군락 Ⅷ이 각각 불연속성을 보이며 구분되었다. 군락 Ⅰ과 군락 Ⅳ는 해발고도 차이에 따른 환경요인의 변화로 인해 구분된 것으로 사료된다. 군락 Ⅵ과 군락 Ⅷ은 물오리 나무의 식재된 인공림과 느티나무 군락의 자연림에 의해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요인과는 다른 원인으로 구분 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1축에 비하여 제2축에 따른 배치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어 군락 분리의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Table 2는 분리된 8개 군락 간의 유사도지수를 파악한 것이다. 칠곡 가산산성 내 식생군락 간의 유사도지수를 분석한 결과, 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은 군락은 군락 Ⅲ(서어나무- 소나무군락)과 군락 Ⅵ(소나무-서어나무군락)로 65.45%의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두 군락 모두 교목층에서 서어나무와 소나무가 높게 우점하고 있으며 굴참나무가 함께 출현하는 것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가장 낮은 유사도지수를 나타내는 군락은 Ⅲ과 군락 Ⅷ로 5.62%의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두 군락이 각 층위별 종구성이 상이하며, 지형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 Ⅲ은 서어나무-소나무군락으로 주로 사면·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락 Ⅷ은 느티나무-상수리나무군락으로 계곡부에 위치하였다.
그 외에도 군락 Ⅵ과 군락 Ⅶ이 다른 군락과 비교적 낮은 유사도지수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군락의 조림유무에 따라 조림수종인 아까시나무, 밤나무, 물오리나무가 우점하는 인공림 군락(Ⅵ, Ⅶ)과 자생수종이 우점하는 자연림 군락 (Ⅰ, Ⅱ, Ⅲ, Ⅳ, Ⅴ, Ⅷ)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군락별 환경특성
Table 3은 TWINSPAN기법으로 구분된 8개 군락의 일반적 개황을 나타낸 것으로, 군락 Ⅰ은 소나무-낙엽활엽수 군락으로 2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발 528~546m, 경사 12~14°에 위치하고 있다. 군락 Ⅱ는 23개의 조사구로 가장 많은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발 469~755m, 경사 10~38°에 위치한 소나무군락이다. 군락 Ⅲ은 서어나무-소나무군락으로 해발 490~763m, 경사 10~41°에 위치하고 있으며, 21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다. 군락 Ⅳ는 소나무-서어나무군락으로 16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발 528~754m, 경사 10~41°의 경사에 위치하고 있다. 서어나무가 우점하여 출현하고 있는 군락 Ⅲ과 군락 Ⅳ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출현하고 있어 낮은 해발고와 급경사 지역에 지엽적으로 분포한다는 Kim et al.(2011)과 Hong et al.(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군락 Ⅴ는 15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발 528~778m, 경사 18~24°에 위치한 물푸레나무-고로쇠나무군락이다. 군락 Ⅵ은 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군락으로 해발 712~745m로 5개의 조사구가 모두 높은 해발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는 15°로 나타나고 있다. 군락 Ⅶ은 아까시나무-밤나무군락으로 해발 431~528m, 경사 9~15°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다. 군락 Ⅷ은 느티나무-낙엽활엽수군락으로 6개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발 445~717m, 경사 4~14°로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3) 군락별 상대우점치 및 흉고직경급별 분석
가산산성 8개 군락의 군락별 상대우점치(I.P.) 및 평균상 대우점치(M.I.P.)를 분석하고, 각 군락별 주요 우점종에 대한 식생의 임분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흉고직경급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군락 Ⅰ은 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으로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I.P. 36.01%로 우점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I.P. 19.31%), 졸참나무(I.P. 17.81%), 굴참나무(I.P. 14.54%)가 뒤를 이어 우점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고로쇠나무가 I.P. 41.28%로 졸참나무(I.P. 16.00%), 신갈나무(I.P. 14.17%), 생강나무(I.P. 12.55%)와 함께 출현하고 있다. 관목층은 생강나무가 I.P. 49.14%로 가장 우점하고 있는 종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수종의 상대우점치는 10% 미만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소나무와 졸참나무는 DBH 27㎝ 이상 구간에서 3개체가 확인되었고, 고로쇠나무는 DBH 12㎝ 이상~17㎝ 미만의 구간에서 3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생강나무가 2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군락 Ⅱ는 소나무군락으로 교목층은 소나무가 I.P. 63.96%로 높은 우점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서어나무(I.P. 31.22%)와 쪽동백나무(I.P. 22.04%)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은 쪽동백나무(32.17%)와 생강나무(I.P. 21.76%)가 우점하여 출현하였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소나무는 DBH 12㎝ 이상 구간에서 9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서어나무는 DBH 47㎝ 미만의 구간에서 69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생강나무가 340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군락 Ⅲ은 서어나무-소나무군락으로 교목층에서 서어나무가 I.P. 41.72%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소나무(I.P. 28.02%), 굴참나무(I.P. 18.53%)가 함께 출현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서어나무가 I.P. 35.09%로 우점하고 있었 으며 쪽동백나무(I.P. 16.41%), 철쭉나무(I.P. 11.74%), 당 단풍나무(I.P. 11.00%)가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있었다. 관목층은 생강나무(I.P. 26.28%), 쪽동백나무(I.P. 21.53%), 철쭉나무(I.P. 18.33%)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그 외 수종의 상대우점치는 10% 미만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서어나무는 DBH 2㎝ 이상~42㎝ 미만의 구 간에서 100개체가 확인되었으며, 관목층에서도 8개체가 확인되었다. 소나무는 DBH 12㎝ 이상의 구간에서 31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생강나무가 296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고 있었다.
군락 Ⅳ는 소나무-서어나무군락으로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I.P. 27.64%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서어나무 (I.P. 22.52%), 굴참나무(I.P. 20.38%), 졸참나무(I.P. 14.01%)가 함께 출현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당단풍 나무(I.P. 31.56%)가 우점하고 있으며, 서어나무(I.P. 19.16%)와 쪽동백나무(I.P. 10.91%)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비목나무(I.P. 18.36%), 생강나무(I.P. 17.97%), 쪽동백나무(I.P. 16.09%)가 함께 우점하고 있었으며, 그 외 수종의 상대우점치는 10% 미만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서어나무가 DBH 2㎝ 이 상의 구간에서 3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소나무는 DBH 17 ㎝ 이상~52㎝ 미만의 구간에서 22개체가 확인되었다. 굴참나무는 관목층에서 36개체가 확인되었으며, DBH 12㎝ 이상~47㎝ 미만의 구간에서 18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비목나무가 22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고 있었다.
군락 Ⅴ는 물푸레나무-고로쇠나무군락으로 물푸레나무가 I.P. 41.51%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고로쇠나무가 I.P. 23.01%, 느티나무가 I.P. 16.75%로 출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교목층에서는 당단풍나무와 생강나무가 각각 I.P. 14.81%, I.P. 10.46%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그 외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출현하고 있 었다. 관목층에서는 팥배나무가 I.P. 27.37%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생강나무(I.P. 20.52%), 노린재나무(I.P. 11.49%)가 함께 출현하고 있었다. 그 외 수종의 상대우점치는 10%으 로 낮게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물푸레나무는 DBH 7㎝ 이상~47㎝ 미만의 구간에서 25개체, 관목층에서 36개체가 확인되었다. 고로쇠나무는 DBH 2㎝ 이상 구간에서 17개체, 관목층에서 40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 에서는 줄딸기가 720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군락 Ⅵ은 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군락으로 층위별 상대 우점치를 살펴보면, 교목층에서는 물푸레나무(I.P. 38.09%)와 물오리나무(I.P. 28.34%), 고로쇠나무(I.P. 14.19%)가 우점하고 있었고, 아교목층에는 물푸레나무가 I.P. 91.23%의 높은 수치로 우점하고 있었다. 관목층은 으름덩굴이 I.P. 66.96%의 높은 수치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쥐똥나무(I.P. 19.93%)가 함께 출현하였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물푸레나무가 DBH 2㎝ 이상~42㎝ 미만의 구간에서 2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물오리나무는 DBH 17㎝ 이상~42㎝ 미만의 구간에서 7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는 으름덩굴이 412 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확인되었다.
군락 Ⅶ은 아까시나무-밤나무군락으로 교목층에 아까시나무(I.P. 44.92%)와 밤나무(I.P. 25.89%), 느티나무(I.P. 18.16%)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아교목층에서 느티나무(I.P. 43.62%)가 우세한 가운데 밤나무(I.P. 12.86%)가 함께 출현하였다. 관목층에서는 비목나무(I.P. 29.40%), 으름덩굴(I.P. 12.10%), 느티나무(I.P. 11.02%), 줄딸기(I.P. 10.07%) 등이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아까시나무는 DBH 7㎝ 이상~37㎝ 미만의 구간에서 24개체, 관목층에서 2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느티나무는 DBH 2㎝ 이상~47㎝ 미만의 구간에서 26개체, 관목층에서 64개체가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으름덩굴이 160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군락 Ⅷ은 느티나무-낙엽활엽수군락으로 교목층에서 느티나무가 상대우점치 36.24%로 우점하는 가운데 상수리나무(I.P. 17.07%), 고로쇠나무(I.P. 15.87%), 아까시나무(I.P. 14.66%) 등이 출현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느티나무(I.P. 57.01%)가 높은 우점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로쇠나무(I.P. 20.08%)가 함께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으름덩굴(I.P. 21.85%), 쥐똥나무(I.P. 21.24%), 느티나무(I.P. 11.85%)가 출현하고 있었으며, 그 외 수종은 상대우점치 10% 미만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느티나무와 고로쇠나무는 전 흉고직경에서 각각 50개체, 15개체가 확인되었으며, 관목층에서도 각각 48개체, 36개체가 확인되었다. 아까시나무는 DBH 12㎝ 이상~32㎝ 미만의 구간에서 5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관목층에서 으름덩굴이 180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각 군락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을 통해 식생천이를 예측하였다. 군락 Ⅰ(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은 교목층에 소나무가 우점하며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가 같이 출현하는 자연림 군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고, 아교목층에서는 졸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점하여 출현하고 있었다.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소나무 우점도는 낮아 향후 천이가 진행되면 우점종인 소나무림은 점차 쇠퇴하고 참나무림 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군락 Ⅱ(소나무 군락)는 교목층에 소나무가 높은 우점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는 낮게 출현하였다. 아교목층에서는 천이 극상수종으로 알려진 서어나무가 우점하여 출현하고 있어, 이는 기존 소나무-서어나무 군락의 천이연구(Lee et al., 1994)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소나무림은 쇠퇴하고 서어나무의 세력이 강해져 서어나무 천이극상림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락 Ⅲ(서어나무-소나무군락)은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모두 서어나무가 우점하고 있어 소나무는 점차 쇠퇴하고 향후 자연림의 서어나무 천이극상림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군락 Ⅳ(소나무-서어나무군락)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지만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소나무의 우점도는 낮았다. 반면 서어나무가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고루 우점하고 굴참나무가 교목층과 관목층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어 향후 서어나무-참나무림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락 Ⅴ(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 군락)는 기존 물푸레나무군락 연구(Bae, 2005)의 결과와 유사하게 향후 물푸레나무와 고로쇠나무가 혼효하면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군락)은 물푸레나무가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어 향후 물오리나무를 쇠퇴시키고 고로쇠나무와 경쟁하며 자연림의 물푸레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군락 Ⅶ(아까시나무-밤나무군락)은 아까시나무, 밤나무, 느티나무가 지속적으로 경쟁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아까시나무와 밤나무의 인공림을 향후 생태적 관리를 통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한 낙엽활엽수 자연림으로의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락 Ⅷ (느티나무-낙엽활엽수군락)은 교목층에서 아까시나무가 중 경목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출현하는 다른 낙엽활엽수에 의해 점차 쇠퇴하여 향후 느티나무와 참나무, 고로쇠나무를 중심으로 한 낙엽활엽수군락으로 천이가 예상되었다.
4) 종다양도
8개 군락의 종다양도를 분석하고자 Shannon의 종다양도 지수(H’), 균재도(J’), 우점도(D), 최대종다양도지수(H′max)를 분석하였다(Table 5). 8개 군락의 평균 종다양도지수는 1.0417로 파악되었다. 같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주왕산국립 공원의 평균 종다양도지수(1.2406)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Lee et al., 1995). 이는 칠곡 가산산성이 과거 전쟁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의 북한산성(1.2757)(Choo et al., 2008),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금정산성(0.9466)(Nam et al., 2010)의 평균 종다양도지수과 비교하여 북한산성 보다는 낮은 종다양도 지수를 나타내었지만 금정산성 보다는 높은 종다양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균재도는 군락 Ⅰ(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이 0.8837으로 조사된 군락 내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의 개체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은 0.4455의 수치로 8개의 군락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교목층의 출현종이 6종으로 우세 정도가 높고 아교목층에 물푸레나무와 관목층에 으름덩굴의 높은 우점도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우점도는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이 0.554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아교목층의 물푸레나무와 관목층의 으름덩굴이 우점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균재도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군락 Ⅰ(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은 0.1163으로 가장 낮은 우점도를 보였다. 이러한 균재도와 우점도는 종다양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칠곡 가산산성의 종다양도는 군락 Ⅳ(소나무-서어나무군락)가 1.2311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균재도가 가장 낮고 우점도가 가장 높은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이 0.52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5) 종수 및 개체수
종수 및 개체수 분석은 각각의 군락에 대해 단위면적(100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Table 6). 칠곡 가산산성 내 조사구의 평균 출현 종수는 10.36±2.60종이었고, 평균 출현 개체수는 90.68±57.63개체로 나타났다. 군락별로 살펴보면, 군락 Ⅰ(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이 12.00±2.83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이 116.80±135.85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확인되었다. 층위별로 살펴보면, 종수의 경우 교목층은 군락 Ⅰ(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이 3.50±0.71종, 아교목층은 군락 Ⅱ(소나무군락)가 5.22±2.24종, 관목층은 군락 Ⅷ (느티나무-낙엽활엽수군락)이 8.00±2.10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다. 개체수의 경우 교목층은 군락 Ⅲ(서어나무-소나무군락)이 6.71±3.58개체, 아교목층은 군락 Ⅱ(소나무군락)이 11.26±5.17개체, 관목층은 군락 Ⅵ(물푸레나무-물오리나무)이 108.80±137.01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