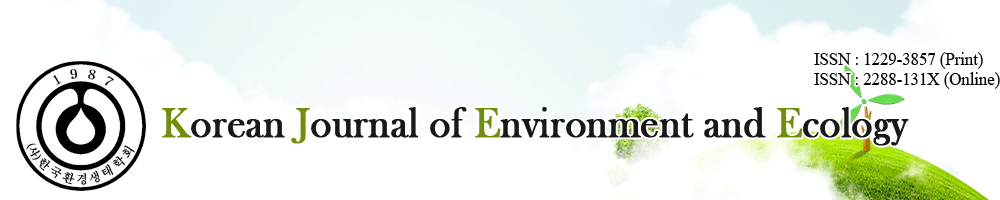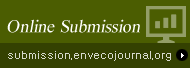1. 생태계 복원의 전개
산림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의 광범위한 훼손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의 붕괴를 일으키며, 이는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협, 수자원 고갈, 재난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은 단순한 자연 보호를 넘어, 기후변화 완화, 탄소 격리, 생물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포괄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특히, 유엔(UN)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아이치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국가 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체계에 복원 관련 조항이 명시되면서, 복원은 국제 사회의 주요 정책 및 연구 의제로 자리매김했다(Suding et al., 2015;Holl and Brancalion, 2020).
복원 실천의 초기 단계는 조림 위주의 기술적 접근에 집중됐으나, 점차 생태학적 이론과 실증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복원의 방향성과 전략이 진화했다. 과거에는 단일 수종 중심의 일률적 조림이 주를 이뤘고(Hobbs and Norton, 1996;Holl and Brancalion, 2020), 종조성이나 생태계 기능 보다는 식재 면적 확대 자체가 성과로 간주하곤 했다 (Bremer and Farley, 2010). 그러나 단일 수종 중심의 조림은 생물다양성의 핵심 요소인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구조적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Veldman et al.(2015)는 비판했다. 특히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정 수 종에 치중된 조림은 본래 그 지역에 존재하던 다양한 식 물군집과 이에 의존하는 동물군집의 복원을 제한하며 (Lindenmayer et al., 2012), 이는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기능적 다양성과 생태적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단순 조림은 장기적인 생태적 자립성(ecological self-sustainability)1)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Veldman et al., 2015), Stanturf et al.(2014)은 생태적 자립성이 모자란 복원지가 지속적인 인위적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외부 교란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조림지는 종간 상호작용, 영양순환, 천이 과정 등 자연 생태계의 복잡한 기능적 메커니즘을 재현하지 못해 스스로 유지·발전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며(Cortina et al., 2006),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능력이 낮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더불어 지역 생태계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조림은 오히려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Veldman et al.(2015)은 본래 산림이 아닌 생태계 에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는 관행이 해당 생태계의 고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이는 지역 생태계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자연적 식생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조림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현대의 생태계 복원은 자연천이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소극적 복원(passive restoration), 제한적 개입을 수반하는 보조적 자연복원(assisted natural regeneration)2), 그리고 적극적인 식재, 토양개량,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 복원(active restoration)으로 구분되며, 입지의 과거 이용 이력, 종자원의 잔존 여부, 주변 경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Holl and Aide, 2011;Chazdon and Guariguata, 2016;Meli et al., 2017).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원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자연천이를 기반으로 한 소극적 복원이 오히려 적극적 조림보다 더 높은 생물다양성과 식생구조 회복을 가져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Crouzeilles et al., 2017). 이러한 방식은 잔존종 자원이나 야생동물의 존재, 주변 삼림의 연계성 등 자연적 복원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효과적이며, 경제적 비용 또한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종자원이 완전히 소실된 지역에서는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생태적 천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종의 혼효 식재, 프레임워크 종 도입3)(Goosem and Tucker, 1995), 지역 유전형 기반 종자 사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기술 등 복합적 기법이 병행됐다 (Stanturf et al., 2014;Menz et al., 2013).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복원대상지의 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대 되고 있다(Stanturf et al., 2014).
생태계 복원의 효과는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됐으며, 생물다양성 회복과 함께 식생구조의 복원, 탄소 저장량 증가, 수문 순환 회복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의 향상이 관찰됐다. Rey Benayas et al.(2009)는 89개 복원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복원지가 비복원지보다 평균 44%의 높은 종풍부도를 나타냈으며, Crouzeilles et al.(2016)은 221개 사례를 분석해 복원사업이 종조성, 생물량, 탄소 흡수능력 등에서 일관된 회복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열대림 지역의 사례를 보면, 코스타리카의 자연천이 기반 복원지에서 는 20년 이내에 성숙림과 유사한 수준의 식생구조가 회복됐으며(Powers et al., 2009), 천이후기종의 확산이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파종 등 보조적 수단이 정착률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Cole et al., 2011).
그러나 복원된 생태계는 여전히 원시림에 비해 고유종의 정착이나 군집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대형 포식자, 생장이 늦은 천이후기종 등은 복원지에 재정착하지 못하거나 수 세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Holl and Brancalion, 2020). 따라서 복원은 기존의 자연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 전략을 보완하고 생물다양성의 연결성과 회복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 종다양성 중심 설계, 생태적 연결구조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Meli et al., 2017).
복원 정책 또한 기술 변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제적으로는 본 챌린지(Bonn Challenge)가 2030년까지 3억 5천만 헥타르 복원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이행하 기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의 AFR100, 중남미의 20×20 이니셔티브 등이 확산됐다(Suding et al., 2015). 각국 정부도 복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농지 산림화 사업(Grain for Green Program)’을 통해 농지에서 산림으로의 토지전환을 촉진하여 수천만 헥타르를 복원했으나, 초기에는 외래종 중심 조림이 이루어져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녔다(Hua et al., 2016). 반면, 코스타리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PES)를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산림 보호와 자연 복원을 유도했으며,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복원 모델로 평가받는다(Aronson and Alexander, 2013).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원정책은 점차 양적 목표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한 나무심기 캠페인에서 벗어나 복원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구성, 생태적 상호작용,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Holl and Brancalion (2020)은 ‘나무 심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Tree planting is not a panacea)’라고 언급하며, 생태계 복원의 본질은 수 종 선택, 천이단계 고려, 지역사회 참여, 모니터링과 관리 지속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산림생태계 복원은 지난 30여 년간 생태학적 이론, 기술적 진보, 정책적 실천의 상호작용 속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복원이 단순한 자연의 복구를 넘어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회복,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원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 검증, 지역별 맞춤형 기술 적용, 사회 -생태적 통합 효과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태계 복원이 실질적인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더욱 정교한 이론적 틀과 경험적 근거가 요구되며, 학제적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통해 복원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산림생태계 복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 또한 지속해서 강화됐다. 특히 산림청이 주도하는 산림복원 정책은 그 역할과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정 이후, 산림복원은 국가 산림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매김했다.
구체적으로, 동법의 개정을 통해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으며, 제42조의2 이하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원대상지 지정, 사업 절차, 기술 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산림복원은 단순한 조림이나 녹화사업을 넘어,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과학적 복원 활동으로 그 개념이 확장됐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기반 또한 점차 구축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개정된 「자연환 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제도를 도입했으나, 환경부 소관의 복원사업에 국한된 근거만을 제공할 뿐, 하천, 습지, 산림,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를 반영한 통합적 복원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Park, 2024). 이러한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복원으로 한정하고, 「산림자원법」에 근거한 산림복원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산림청은 2000년대 이후 산림복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은 2023년까지 총 1,490여 개소, 누적 약 15,500ha 규모로 시행됐다(산림청 보도자료, forest.go.kr 참조).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 중 하나는 「섬숲생태 복원사업」이다. 산림청은 2021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3개 도서에서 약 213ha 규모의 복원을 완료했으며, 2029년까지 총 765ha의 복원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은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원식생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섬숲생태 복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복원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 간의 복원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담당 공무원의 생태적 이해 부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 매뉴얼의 부재 등이 복원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Park et al., 2021). 이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에 대한 심층적인 생태학적 기반에 입각한 생태계 복원 개념 정립과 복원전략의 공론화가 시급히 요구됨을 뒷받침한다.
2.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형성과 훼손
1) 형성 시기
한국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은 후기 플라이스토세 말기4)(약 15,000∼11,700년 전)에서 홀로세 초기(약 11,700 ∼8,200년 전)에 이르는 시기의 기후 완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식생 분포사적 변화에 깊이 연관되어 형성된 식생유형으로 이해된다(Daniel, 1966;Chung, 2007;Park and Park, 2009). 후기 플라이스토세 말기까지 지속된 마지막 빙기 동안 한반도는 냉대성 침엽수림과 낙엽 활엽수림의 혼효림이 주를 이뤘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해안 지역에서도 가문비속, 전나무속, 자작나무속 중심의 식생이 우세했다(Chung, 2007;Yi and Kim, 2010). 그러나 약 13,000년 전부터 점진적인 기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남부 및 제주도 지역에서 난온대 상록 활엽수종의 화분이 출현하기 시작했다(Moon and Chung, 2005;Park and Park, 2009; Figure 1). 특히 가시나무속과 구실잣밤나무속 등 주요 상록활엽수종의 화분이 제주도 남부 시추코어에서 확인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난온대림으로의 식생 전환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Chung et al., 2004). 이 시기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지형적 연결이 약화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구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 아래에서 동아시아 내 식생 피난처(refugia)로 기능했다(Daniel, 1966;Park, 1981). 이는 일본 규슈 남부 및 중국 남부 해안과 유사한 상록활엽수림이 제한적으로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Matsuoka, 1994). 이후 약 10,000년 전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지리적으로 분리되면서 식생의 독립적 천이가 진행됐고, 제주도 하논마르 및 김녕사구 등의 퇴적물 분석을 통해 상록활엽수림이 점차 우점식생으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됐다(Yasuda, 1982;Chung, 2007;Park and Park, 2009). 약 6,000년 전경에는 남해안 육상 지역에서도 상록활엽수종의 화분이 확인됐으며(Choi et al., 2005), 일본 규슈(九州)와 주고쿠(中国) 지역 일대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식생 확산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Yasuda, 1982).
그러나 약 4,000년 전부터는 일시적 기후 냉각과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상록활엽수림의 북상이 정체됐고, 분포는 남해안과 동남해안의 저지대·도서지역에 국지화됐다 (Choi, 1998;Song, 2002;Choi et al., 2005). 이후 약 1,500년 전부터는 기후가 다시 온화해지고 해수면이 현재 수준에 근접하면서, 상록활엽수림은 도서 및 해안 지역에 고립된 형태로 정착했다. 이와 같은 분포 양상은 일본 남부 상록활엽수림과의 생물지리학적 유사성, 유전적 종자원(species pool)의 공유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Park and Park, 2009;Aoki et al., 2014). 특히 약 6,000년 전부터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일대에서 가시나무속, 구실잣밤 나무속, 후박나무속 등의 난온대 상록활엽수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우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남해 도서 및 해안 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상록활엽 수림의 구조 및 종조성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Choi, 1998;Choi et al., 2005;Choi, 2013).
Park and Park(2009)과 Choi et al.(2005)의 화분학적 연구에 따르면, 홀로세 중기(약 8,200∼4,200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나무속과 구실잣밤나무 속이 우점하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 안정적인 군집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기후 온난화와 해양성 기후의 안정성 속에서 군집구조가 정착된 결과로 해석되며, 남부 해안가와 도서지역 정착에 따른 농경 등에 따른 인위적 교란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이 상록활엽 수림은 극상림(climax forest)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분학적 자료는 복원의 기준으로 삼는 참조생태계(reference ecosystem)로서 난온대림의 종조성과 군집구조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사적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난온대림 복원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틀로 기능할 수 있다.
2)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훼손 및 현황
한반도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하, 난온대림5))은 기후 적으로 적합한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나, 수 세기 동안 반복된 인위적 간섭과 개발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을 겪어왔다.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난온대림의 주요 수종들은 조공(朝 貢)과 생활자원으로 지속해서 활용됐다. 예를 들어, 고려 충렬왕 8년(1282년)에는 “좌랑(佐郞) 이행검(李行儉)을 원나라에 보내 황칠(黃漆)을 진상했다(遣佐郞李行儉,如元進 黃漆)”는 기록이 고려사절요(db.history.go.kr)에 남아있으며, 이는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가 외교적 공물로 이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어 계미년(1283년)과 계유년(1273년)에는 “향장목(香樟木)” 즉 녹나무(Cinnamomum camphora)6)를 탐라(제주)에서 원나라에 바치도록 명한 기록도 확인되며, 이는 난온대 수종이 고급 목재로서 국가적 조공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용은 조선시대까지도 지속됐다. 정조 18년 (1794년)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에는 “완도는 황칠이 생산되는 곳으로, 강진·해남·영암 등에서 연례적으로 황칠과 숯을 바치는 제도가 있다(皆有年例所納)”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특정 자생 수종에 대한 채취와 공출이 지역 단위로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된 이용은 난온대림의 구조적 안정성을 약화했고, 결국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졌다. 광해군 8년(1616년) 실록에는 “변산, 완도, 안면곶, 장산곶 등지의 재목을 멋대로 베어간다(邊山, 莞島, 安眠串, 長山串等處材木, 恣意偸伐云)”는 보고가 있으며, 정조 7년(1783년)에는 “완도가 가장 산림이 번성했으나, 도벌이 날로 심해지고, 무단 경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海則莞島爲最盛, 而偸斫日甚, 冒耕漸滋)”는 표현이 나타나는 등, 이미 조선 시기에 도벌과 화전 개간에 따른 섬 지역의 산림 파괴가 광범위하게 지속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훼손 양상은 조선 후기 이후 더욱 가속됐는데, 특히 16세기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남해안 도서지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생활 연료 확보, 농경지 개간, 가축 방목 등을 위한 무분별한 남벌(濫伐)과 도벌(盜伐)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Oh and Kim, 1996). 일제강점기에는 군수 물자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벌채와 함께 외래 조림수종의 도입이 본격화됐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 조림 정책이 주로 곰솔과 사방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의 녹화 및 경제수종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정책적 흐름 속에서 원식생인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은 거의 전면적으로 소실됐으며, 현재 난온대 지역의 대부분은 곰솔과 낙엽성 참나무류로 대체되면서 이차림 또는 퇴행천이 식생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Oh and Kim, 1996;Choi, 2013). 이러한 소실 양상은 최근 식생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Sung et al.(2022)의 전라남도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록침엽수림이 전체 면적의 53.4%, 낙엽활엽수림이 22.2%를 차지한 반면, 상록활엽수림은 5.5%에 불과해, 원식생으로서의 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훼손되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존 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당숲, 방풍림, 어부림 등의 전통적 공간이나 일부 천연기념물 지역에 파편화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극상림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e.g. Oh and Kim, 1996;Park et al., 2018). 더욱이 지리적 고립성과 입지 특성(예: 해풍, 염해, 건조, 얕은 토심 등)으로 인해 자생종의 자연 확산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수종의 침입에 따른 식생 교란도 보고됐다(Sung et al., 2021). 난온대림이 잔존한 도서지역은 육지와 지리적·유전적으로 고립되어, 해당 환경에 적응한 고유한 기능적 형질의 생물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Kim et al., 2016;Russell and Kueffer, 2019). 그러나 높은 생태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미비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연료목 채취, 불법 농경, 방목 등으로 난온대림 훼손이 지속되어 왔다
3. 난온대 지역의 식생유형 및 천이계열
1) 식생유형
한반도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은 주로 전라남도 해안 도서 및 제주도에 분포하며, 이러한 분포지역은 일본 규슈, 중국 동남부, 대만 등과 함께 동아시아 난온대 기후대의 북방한계에 해당한다(Fujiwara, 1981;Park et al., 2021). 이 숲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연중 비교적 온화한 기온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 패턴을 보이는 동아시아 몬순 기후 아래에서 발달하며, 저온과 건조에 민감한 상록활엽수 종이 주요 구성종으로 나타난다(Box and Fujiwara, 1988). 기후적 조건은 연평균 기온이 14℃ 이상, 최한월 평균기온이 -1.7℃ 이상이며, 연강수량은 1,200∽1,500mm 이상으로, 겨울철에도 평균기온이 0℃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해양성 기후 특성이 두드러진다(Fujiwara, 1981;Box and Fujiwara, 1988). 이러한 조건에 형성되는 상록활엽수림은 중국 남동부와 대만, 일본 규슈 및 혼슈 남부, 그리고 한국 남해안 도서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지역별 생육지 조건과 미기후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식생유형을 이룬다.
한국의 경우, 상록활엽수림은 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며, 주요 우점종으로는 후박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 나무 등이 보고됐다(Choi, 2013;Park et al., 2021;Kang et al., 2022). 일본에서는 규슈와 시코쿠 지역이 난온대 상록 활엽수림의 대표적인 분포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세계자 연유산인 야쿠시마(屋久島)에서는 해발 고도에 따른 식생의 수직적 분포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지대(해발 10∽ 600m)에는 구실잣밤나무와 참가시나무, 중산간 지역(600∽ 1,000m)에는 붉가시나무와 조록나무, 고지대(1,000m 이상)에는 삼나무와 일본전나무(Abies firma)등의 침엽수가 분포 한다(Miyawaki, 1980). 이러한 고도별 식생대 분포 양상은 규슈 내륙에 위치한 상록활엽수 원시림 지역, 예컨대 미야자 키현 아야정(綾町)・오모리다케(大森岳), 가고시마현 이나오다케(稲尾岳)・구리노다케(栗野岳), 구마모토현 이치후사산(市房山) 등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며, Miyawaki (1982)가 제시한 식생 분포의 일반적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Song and Da(2016)는 중국의 상록활엽수림을 동부와 서부로 구분했다. 동부지역은 기후 조건에 따라 돌참 나무속(Lithocarpus)-가시나무속(Cyclobalanopsis)형(I유형), 녹나무속(Cinnamomum)-후박나무속(Machilus)형(Ⅱ 유형), 스키마속(Schima)-구실잣밤나무속(Castanopsis)(Ⅲ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과 Ⅱ유형은 한국·일본의 전형적인 상록활엽수림과 유사하다. 서부지역의 상록활엽수림은 인도양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고산지대에 분포하 며, 주로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쓰촨성(四 川省)의 해발 1,600~2,500m에 출현한다. 이 지역 식생은 구실잣밤나무속-가시나무속형과 돌참나무속(Lithocarpus) 형으로 구분되며, 기후 조건에 따라 수종조성이 다르다. 서부는 겨울에 건조하고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며, 이에 따라 잎이 작고 털이 많은 교목종이 우점한다.
대만과 일본 난세이 제도(오키나와 등) 역시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상록활엽수림이 광범위하게 발달하며, 구실 잣밤나무, 후박나무, 생달나무 등이 주요 교목으로 우점한다. 대만의 경우, 해발 500∽1,500m 구간에서는 후박나무– 잣밤나무림이 형성되며, 이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가시나무 아속과 돌참나무속이 우점하는 난온대 내지 온대성 식생으로 천이가 진행된다. 특히 대만 중산간 지역의 상록활엽수림은 일본 규슈와 유사한 기후 조건 및 종조성을 공유한다 (Song and Da, 2016).
그러나 한국의 상록활엽수림은 지리적 제한성과 역사적 교란에 따라 분포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대부분은 과거의 인위적 간섭 때문에 대상식생(代償植生)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Oh and Kim, 1996).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일부 당숲이나 방풍림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소 면적의 파편화로 인해 종자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천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종조성이나 특정 종의 편중 분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천이 경로와 상이한 편향천이(biased succession)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Azuma, 2014).
Park et al.(2018)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상록활엽수림대를 비교하여, 우점종 조합과 입지환경에 따른 식생유형을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는 후박나무가 조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 충적지 및 사면 하부에서 우점하며 ‘후박나무림형(Machilus forest type)’을, 구실잣밤나무가 비교적 건조한 내륙 사면에서 우점하는 ‘잣밤나무류림형(Castanopsis forest type)’을, 참가시나무와 붉가시나무 등 가시나무류가 저온 환경의 고지대에서 우점하는 ‘가시나무류림형 (Cyclobalanopsis forest type)’을 제시했다. Figure 2의 식생유형은 기온 조건(최한월 평균기온), 해안선과의 거리 (내염성) 등 환경요인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Hattori, 1993;Hattori et al., 2008). 한편, 한반도 난온대림의 식생 구조와 종조성은 일본 규슈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약 13,000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상록활엽수종의 확산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종자 전파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Park and Park, 2009;Aoki et al., 2014). 이와 관련 해 Oh(1995)와 Choi(2013) 등은 양 지역 간 유사한 군락 구성과 종조성을 다수의 사례로 입증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은 기후적, 지리적, 입지환경적 요인에 따라 3가지 식생유형을 형성하며, 그 구조와 조성은 지역 생태계의 극상림 또는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식생유형에 대한 이해는 해당 지역의 복원계획 수립과 관리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2) 난온대림 천이계열
난온대림 천이계열은 입지환경, 기후조건, 교란 이력, 종자공급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 지역의 천이는 일반적으로 2차천이며, 인간의 간섭 이후 자연 복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식생변화로 설명된다. 천이의 종착점은 보통 극상림(climax forest)이라 부르며, 토양 및 기후 조건이 안정되고 갱신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극상’은 기후극상(climatic climax)과 토지극상(edaphic climax)으로 나뉘며, 동일한 기후 조건이라도 조풍, 염해, 건조 등 특수한 입지에서는 후자가 성립 된다(Masaki and Aiba, 2011).
일본과 중국 등 난온대 지역에서는 천이계열을 실증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됐다. 특히 일본 미야케지마(三宅島), 하치죠지마(八丈島), 사쿠라지마(桜島) 등 화산 섬에서는 화산분화 연도를 기준으로 형성된 토양과 식생의 발달단계를 비교해 장기 천이계열을 밝히는 시도들이 보고 됐다. 예를 들어 Kamijo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미야케지마에서는 16년 차에는 낙엽활엽수와 초본이 우점했고, 125년 차에서는 후박나무를 중심으로 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됐으며, 800년 이상 지난 지역에서는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는 극상림이 출현했다. 사쿠라지마에서는 억새~호장 근 3~48년, 곰솔림 52~170년, 후박나무림 232~535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Hattori et al., 2012). 이처럼 천이 속도는 종의 특성, 입지조건, 종자 확산 가능성, 초기 식생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attori et al.(2012) 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천이단계별 소요시간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의류 및 이끼 군락에서 초본군락으로의 천이는 약 20~50년, 초본군락에서 곰솔림으로의 천이는 약 50~150년, 곰솔림에서 후박나무림으로의 천이는 약 150~3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구실잣밤나무림으로의 천이는 6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후박나무림이 일시적으로 우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실잣밤나무와 같은 극상종으로 대체됨을 보여준다. 중국 남동부의 제지앙성(浙江省)과 윈난성(雲南省)에서도 유사한 천이계열이 보고됐으며, 소나무류(Pinus massoniana, P. yunnanesis)와 낙엽성 참나무류에서 시작하여 구실잣밤 나무속과 Schima superba로 천이되며 극상림이 형성됐다 (Wang et al., 2007;Tang, 2010).
한편, 한국의 난온대림은 대부분이 2차림 또는 인공림이며, 천이 연구는 주로 잔존한 당숲, 방풍림, 자연림, 또는 퇴행된 수림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이들 식생은 조성된 연대가 불명확하고, 편향천이(plagiosere)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천이단계 추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갱신 과정이 단절된 경우도 많다(Oh and Choi, 1993). 그런데도 식생구조, 종다양성, 토양요소 등의 정량분석을 통해 한국 난온대림의 대표적인 천이계열은 대체로 정리된다. 초기단계는 곰솔, 소나무, 졸참나무 등 양수성이 강한 선구종이 우점한다 (Figure 3). 이후 중간단계에서는 후박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육박나무 등이 점차 등장하며 교목층으로 자라난다. 이 단계는 다양한 상록활엽수종이 혼효된 천이단계로, 종조성이 비교적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한 것이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 극상단계에서는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의 극상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단순하고 균질한 교목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ark et al., 2018).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극상림으로의 천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단계의 특정 수종이 고정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조풍의 영향이 심하거나 구실잣밤나무 등의 종자 공급원이 차단된 섬 지역에서는 후박나무가 교목층을 지배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토지극상을 형성하는 곳이 많았다(Park et al., 2021;Kang et al., 2022). Hiroki(2016)의 연구에 따르면, 후박나무와 구실잣밤나무의 종자 특성과 생리적 차이는 천이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저광도 조건에서 구실잣밤나무는 생장 효율이 높아 후박나무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후박나무림은 극상에 이르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태로 보며, 이후 종자의 유입 및 천이유도 조건이 충족되면 구실잣밤나 무림으로 전환될 수 있다.
난온대림의 천이계열은 기후 조건에 따른 이상적 천이뿐 아니라, 입지의 특수성, 교란 이력, 종자원 유무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보인다.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복원 및 관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천이단계별 특성과 도달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별 목표 설정과 입지 적합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부분 지역이 2차 림으로 구성된 경우, 종 다양성과 후계목 구조를 고려한 생태적 복원이 중요하며, 중간단계에서 정체된 군락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생태적으로 타당한 복원목표로 간주할 수 있다.
3) 난온대림 복원과 참조생태계
생태계 복원은 단순히 훼손된 지역에 식물을 심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원래의 생태계가 지녔던 구조와 기능, 종 다양성을 회복하는 생태적 과정이다(SER, 2004). 그러나 이때 복원이 지향해야 할 ‘원래의 생태계’ 또는 ‘원식생’이라는 개념은 시공간적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그 정의와 적용 시점 또한 모호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복원의 방향성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참조생태계(reference ecosystem)이다(Clewell and Aronson, 2013). 참조생태계란 복원대상지와 같거나 유사한 생태지역(ecoregion) 내에 위치하며, 인간의 간섭이 미미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Gann et al., 2019;ERS, 2024). 이는 복원사업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생태적 상태를 경관적·기능적 관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의 구실을 하며, 복원의 방향성 설정과 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준거틀을 제공한다.
참조생태계는 복원대상지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해하고, 현재의 입지 조건에서 어떠한 생태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비교 대상이다. 이는 복원대상지의 잠재자연식생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실존하는 실제 생태계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복원사업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SER, 2004). ERS(2024)은 참조생태계를 ‘복원 대상지가 회복되어야 할 생태적 상태에 대한 기술적·생태적 지침을 제공하는 모델’ 로 정의하며, 이를 설정함으로써 복원의 방향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참조생태계로 설정 가능한 대상지는 일반적으로 ▲원식생(original vegetation)이 잔존하는 지역, ▲천연기념물 보호림, ▲문화전통림(당숲, 방풍림 등), ▲기후극상림(climatic climax forest), ▲인간 간섭이 적고 자생종으로 구성된 안정된 숲 등이다(Gann et al., 2019;Park et al., 2021;ERS, 2024). 특히 난온대 도서지역의 경우, 인위적 개입이 적은 당숲, 천연기념물, 외딴섬의 천연림 등이 참조생태계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완도 주도의 천연기념물 상록활엽수림이나 제주도 안덕면 상록활엽수림, 제주도의 봉호리 성황당림 등은 전형적인 난온대 참조생태계 사례로서 종조성, 층위 구조, 토양 특성 등이 복원대상지의 식생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참조생태계는 난온대 천이계열상 후기단계인 극상 림이거나 토지극상일 가능성이 크다.
참조생태계는 복원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복원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복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식생의 변화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복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원지의 구조적 안정성, 종조성, 천이단계 등을 참조생태계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SER, 2004).
4.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복원의 방향
1) 생태계 복원과 복원사업의 개념적 차이와 실행적 함의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은 훼손되거나 붕괴한 생태계를 생물학적·물리학적·사회생태적 측면에서 원래 상태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 시키는 과학적·윤리적 노력이다(SER, 2004). 이 개념은 단순히 자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 복원은 생태계의 자기조절능력,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지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생태적 균형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 과정이다(Hobbs and Harris, 2001;Higgs, 1997). 이와 달리, 「생태계 복원사업(ecosystem restoration project)」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생태계가 자생적 회복력을 바탕으로 목표 상태(원래 생태계)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조적·기능적 회복 경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때 복원사업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을 넘어, 복원 대상 생태계가 특정한 회복 경로 (생태계 궤도)를 따라 안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Hobbs and Norton, 1996;Gann et al., 2019;Manhães et al., 2022).
Figure 4는 생태계 복원의 지향점과 복원사업의 실천적 역할을 구분해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훼손된 생태계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열차에 비유될 수 있으며, 복원사업은 이 열차가 원래의 종착역인 참조생태계(reference ecosystem)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로를 정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경로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복원사업은 단편적인 기술 개입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가 자발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원래 상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태계 궤도(ecosystem trajectory)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Klimkowska et 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계 복원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라면, 복원사업은 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일정한 경로로 회복시키는 실천적 매개이다. 생태계 복원은 ‘원칙 중심적(principle-based)’이며 개념적으로 유연한 생태철학적 지향인 반면, 복원사업은 ‘설계 기반(design-based)’의 기술 체계로, 현장 중심의 적용과 실천적 관리를 중점으로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 복원과 복원사업 간의 개념적 구분과 기능적 연계가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며, 생태계 궤도의 설정은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통합된 순응적 설계(adaptive design)의 원칙에 따라 접근되어야 한다(Hobbs and Harris, 2001;Gann et al., 2019). 복원사업은 대상지의 입지조건, 훼손 양상, 토양 및 기후 환경, 종자원 확보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 유형 및 기법(예: 수하식재, 외래종 제거, 토양개량)과 시공 방법(예: 모듈군락식재, 고밀도 식재)을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복원사업이 복원 그 자체라기보다 복원의 가능성을 여는 시도적·조정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 복원생태학은 생태계의 반응이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복원사업을 단회적 개입이 아닌 순응적(adaptive) 관리체계로 이해한다(Walters and Holling, 1990). 순응적 복원은 복원사업을 일종의 실험적 개입으로 간주하며, 사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복원은 ‘계획대로 실현되는’ 정적 과정이 아니라, ‘배우고 수정하며 진화하는’ 동적 시스템이다(Choi,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복원사업의 성패는 정밀한 설계 자체보다도 유연한 설계 구조와 반복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 체계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복원 정책에도 적용된다. 복원 정책이 단기적 면적 확대나 수종 식재량 같은 양적 지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복원은 단기적 치적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반면, 생태계 복원의 효과를 생물다양성 구성, 생태적 상호작용,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 등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때 복원사업은 복원 그 자체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Menz et al., 2013;Holl and Brancalion, 2020). 요컨대, 생태계 복원과 복원사업은 ‘목표’와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뚜렷이 구분되며, 복원 실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과학적 이상과 정책적 현실을 조율하는 설계 능력과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복원은 단일한 해답이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지의 맥락적 조건과 사회생태적 요인을 반영한 복수의 접근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복원사업은 그러한 유연한 틀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
2) 난온대림 복원의 방향
앞서 난온대림의 형성에서 논의했듯이 화분학적 연구 (e.g. Song, 2002;Park and Park, 2009)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 해안과 도서지역의 원식생은 상록활엽수림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난온대림 복원의 생태적 정당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과거의 남벌, 연료 채취, 경작지 개간 등의 지속적인 인간 간섭으로 인해 본래의 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파편화되거나 퇴행천이 상태로 전락했으며,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21).
이러한 생태적 퇴행을 회복하고자 하는 난온대림 복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음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 남해안과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회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적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동아시아 난온대 생물지리구역에서 고유한 생태계 유형으로서 상록활엽수림의 대표성과 생태적 연속성(ecological connectivity)을 회복하는 데 있다.
난온대림 복원사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와 자원 투입으로 조기에 해당 지역의 참조생태계 또는 잠재자연식생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토양개량이나 수종 식재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태계 궤도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복원생태학의 이론적 핵심(Hobbs and Harris, 2001)과 일치한다. 복원사업의 단기적 목표는 식재 수종의 활착과 수관층 우점 확보를 통해 초기 생육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천이 과정을 촉진해 구조·기능·종조성 측면에서 참조생태계에 준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 복원대상지의 종조성, 식생구조, 토양 조건 등의 상태를 고려해 복원유형을 구분하고, 경쟁수종의 선택적 제거, 식생구조를 재현하는 군락식재, 토양개량 등 의 기법을 통해 천이 속도를 가속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Lamb et al., 2005;Park et al., 2021).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은 자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복원대상지 선정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종자 공급원(seed source) 구실을 할 수 있는 핵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집중해야 하며, 종자 유입이 제한적인 외딴섬 지역과 같이 자연천이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지역에는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원사업이 요구된다(Park et al., 2021).
5.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복원전략
생태계 복원은 훼손된 생태계의 구조적 건전성(structural integrity)과 기능적 효율성(functional efficiency)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 절차로 정의된다(Gann et al., 2019;SER, 2004). 복원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복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참조생태계가 도출된다. 이후 복원대상지의 훼손 수준 및 생태적 맥락에 따라 소극적 복원, 보조적 자연복원, 적극적 복원 중 적절한 유형과 기법이 선택되어 적용된다(Chazdon and Guariguata, 2016). 실질적인 복원 시공 단계에서는 토양환경 개선, 복원수종 식재, 외래종 제거 등 다양한 생태공학적 조치가 동원되며, 복원의 효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Bernhardt et al., 2005;Rey Benayas et al., 2009). 또한 생태계 복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Suding et al., 2015).
국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자원법」 제42조 제5항부터 제7항에 근거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복원계획 수립, 시공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토양환경 복원, 훼손등급 진단 방법론, 복원유형 및 기법 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숙련된 적용이 여전히 실무적 미흡함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복원사업의 효과 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복원전략은 복원대상지에 대한 생태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및 자원 투입을 통해 생태계 궤도를 조기에 회복하고, 천이 가속화로 참조생태계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에 근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상록 활엽수종이 수관층을 우점하고, 참조생태계와 유사한 식생 구조 및 층위 체계를 갖추는 것을 단기목표로 설정하며, 30년 이내에는 경관적·기능적 측면에서 참조생태계와 유사한 수준의 자립 생태계로 이행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는 단계적 복원 프레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 복원, 훼손 정도 진단, 복원유형화에 따른 기술 적용의 정합성이 핵심 구성요소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난온대림 복원전략의 기반을 이루는 토양환경 복원, 훼손등급 평가체계, 그리고 복원 유형 및 기법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토양환경 복원
생태계 복원사업의 실효성은 식생 도입 및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복원대상지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토양환경의 회복과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Heneghan et al., 2008;Harris, 2003). 토양환경 복원은 생태계 복원의 핵심 단계로서, 식물생육 기반 조성과 미생물군 복원, 양분순환 체계의 회복을 통해 식생 정착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과업이다. 도서지역처럼 조풍, 염분 등의 환경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곳에서는 토양층이 훼손되거나 퇴화된 경우가 많아 식생 발달과 복원사업이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SER, 2004;Rey Benayas et al., 2009;Clewell and Aronson, 2013).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식생복원에 앞서 토양환경 복원을 우선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교목층의 활착과 자생식생의 회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해질 수 있다.
복원대상지의 토양은 생태계 내에서 수분 저장, 양분 순환, 미생물 군집의 서식처 등 핵심 생태기능을 수행하며, 초기 식재 수종의 활착률과 생장률, 나아가 장기적인 자생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adshaw, 1997). 이에 따라 최근 복원생태학에서는 토양환경 복원을 단순한 토사 공급이나 표토이식의 수준을 넘어,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구축 과정으로 재정의한다(Heneghan et al., 2008). 이는 복원이 단순한 식재 행위가 아니라, 생물과 비생물 간 상호작용을 복원하는 ‘생태적 프로세스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SER,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복원 사업의 핵심 과제인 생태계 궤도 회복과 천이 가속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양환경 복원은 먼저 토양환경 진단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토심, 입도 분포, 투수성(배수성), pH, 유기물 함량, 양이온치환용량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토양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토이식, 유기물 첨가, pH 조정, 토양개량제 혼합 등 복합적 조치를 설계하게 된다. 토양환경 복원 공정에서 우선시되는 방법은 표토 이식으로, 인근 유사 입지에서 채취한 표토를 운반하여 포설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유기물, 미생물, 매토종자 등을 포함한 토양환경 복원과 식물생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이식 표토의 채취 두께는 보통 5~15cm 내외로 설정되며, 과도한 채취는 기존 산림지의 생태적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 적용이 권장된다. 표토이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보완 조치로는 외부 재료를 활용한 토양개량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퇴비, 바크퇴비, 부엽토, 피트모스 등의 유기물원과 점토계 토양개량제(소성 규조토 등), 바이오차 등을 활용하며, 현장 토양과 혼합하여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수분보유력이 낮은 사질 토양에는 피트모스나 펄라이트 등을 혼합해 소공극량을 늘리고, pH가 낮은 산성토양에는 석회고토 등을 활용하여 중 성화시킬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외래 토양 반입 시 매토종자의 혼입에 따른 식생교란 위험이 존재하므로, 토양원은 가급적 인근 생태 유사지역의 심토를 활용한다. 또한, 토양개량을 통한 토양수분량 증대는 식생 활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미세저지대(micro-catchment), 수분유도 도랑(water harvesting trench), 멀칭, 방풍벽 설치 등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ochet and García-Fayos, 2004). 특히 멀칭은 증산 억제 외에도 토양 온도의 안정화, 잡초 발생의 억제, 미생물 활성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토양 보전은 물론 초기 식생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관리기법으로 간주한다(Olmos-Ruiz et al., 2025).
요컨대, 토양환경 복원은 단지 식생 도입을 위한 보조적 기반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핵심적 선결 조건이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회복의 기초를 제공하는 생태적 토대이다. 특히 복원사업의 성공 여부는 토양환경을 얼마나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당 입지에 맞는 토양환경 복원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복원사업 설계 시에는 토양 복원계획을 생태계 복원의 출발점이자 지속가능성의 열쇠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실천적 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훼손등급 평가
산림생태계는 식생구조의 이질성, 수종 간 경쟁관계, 생장주기, 토양 및 수문 조건 등 복합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적 시스템으로서, 복원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대상지의 훼손 상태와 수준을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Hobbs and Harris, 2001;Suding et al., 2004). 이는 복원전략의 방향, 에너지 투입의 강도, 투입 자원의 범위,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많은 복원사업이 식생 피복률이나 식재 본수 등의 단순 정성 지표에 의존해 사업을 기획해 왔으나, 이는 대상지의 실제 생태적 복원력이나 종다양성, 자생식생의 천이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Holl and Aide, 2011). 특히, 동일한 면적의 산림이라 하더라도 수관층 구성과 우점 정도, 종조성, 토양 유기물 함량 등의 생태적 특성은 현격히 다를 수 있으며, 복원의 효과성은 이러한 미세한 생태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Choi, 2007). 따라서 복원사업은 ‘면적 기반의 일률적 식재계획’이 아니라, ‘훼손 상태에 기초한 정밀 설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지표 체계의 구축과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림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훼손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지를 구역화하여 복원설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식생의 발달단계, 상록활엽수종의 우점도 및 출현 종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훼손등급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복원대상지를 I∽V등급으로 정량화하고 이에 따라 보존형, 유도형, 개량형, 조성형의 복원유형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 전략이 요구된다(Park et al., 2021). 이러한 등급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뿐만 아니라, 복원 성과의 객관적 비교 및 평가, 사후 관리계획의 체계화에도 기여한다. 실제로 브라질 대서양 산림복원 사례에서는 훼손 강도에 따라 자연천이 유도형(assisted regeneration)과 적극적 식재형(active restoration)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생물다양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했다(Crouzeilles et al., 2020). Park et al.(2021)은 난온대림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6단계의 훼손등급 분류체계를 제시했다(Table 1). 이 체계는 교목층 상록활엽수의 상대 우점치 및 교목성 상록활엽수의 출현 종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 복원유형을 구체화한다. 상대우점치가 90% 이상이면 ‘성숙단계(mature)’로 분류되며, 훼손등급 I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생태계의 자생적 안정성이 높은 상태로, 복원유형은 ‘보존형’으로 설정되며, 인위적 에너지 투입보다는 모니터링과 간섭 최소화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완도 주도와 같은 천연기념물 보호림이 이에 해당하며, 이곳은 복원사업 전후에 현 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상대우점치가 50∽90%인 경우는 ‘발달단계(developmental)’ 로 간주하여 훼손등급 II로 분류된다. 이 단계는 상록활엽수와 침엽수 또는 낙엽활엽수가 교목층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복원 유형은 ‘유도형’이다. 복원전략은 경쟁수종의 제거를 통해 상록 활엽수종의 우점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대우점치가 50% 이하이면서 교목성 상록활엽수종이 4종 이상 출현하는 경우는 ‘천이단계(pioneer)’로 판단되며, 훼손등급 III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유도형 복원이 적용된다. 반면, 교목성 상록활엽수종의 출현 종수가 4종 미만일 경우는 훼손등급 IV로 간주하며, 이때는 종이입 및 경쟁수 종 제거의 생육 기반을 개선하는 ‘개량형’ 복원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초지, 산불지, 묵밭 등 기존 산림이 소실되어 식생 기반이 붕괴한 지역은 ‘퇴행단계(regression)’로 분류되며, 훼손등급 V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자연림 회복을 목표로 한 적극적 식재기법인 모듈군락식재기법(Han and Park, 2022)을 적용하여 상록활엽수림을 조기에 조성하는 ‘조성형’ 복원이 추진된다.
이처럼 난온대림 훼손등급 평가는 식생 발달단계의 정량적 지표화와 복원유형의 정합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대상지의 생태적 위상에 따라 복원 개입의 강도와 기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과 복원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복원 설계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복원 후 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단계에서도 해당 등급체계를 지속해서 활용함으로써 복원의 방향성과 속도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평가체계는 복원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개입’이라는 논리구조가 필수적이며, 이는 훼손 정도 진단 – 복원유형 및 기법 선택 - 모니터링 - 재조정이라는 순환적 복원 프레임 구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3) 복원유형 및 기법
생태계 복원은 훼손 또는 파괴된 생태계를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SER, 2004). 복원사업의 전략은 대상지의 훼손 정도, 자생 복원력, 그리고 경관적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유형으로 구체화된다(Holl and Aide, 2011). 일반적으로 복원유형은 인위적 개입의 강도와 기술적 조치의 범위를 기준으로 소극적 복원, 보조적 자연복원, 적극적 복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Meli et al., 2017).
이 중 ‘소극적 복원’은 최소한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자연 천이 과정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교란 요인의 제거만으로도 생태계 회복이 쉬운 지역에 적용된다(Suding et al., 2004). 예를 들어, 농경 활동 중단이나 방목 통제와 같이 잔존 종자원 및 생물상을 활용한 자연 회복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외부 조치 없이도 식생이 자생적으로 복원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Chazdon and Guariguata, 2016).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생태계의 자생적 회복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입지 조건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 또한 내포한다(Holl and Aide, 2011).
이에 비해 ‘보조적 자연복원’은 자생 회복 가능성을 전제로, 외래종 제거, 덩굴류 차단, 경쟁 수종 제거, 치수 보호 등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기술적 개입을 통해 천이 과정을 촉진하는 유형이다(Holl and Aide, 2011). 이는 자연 회복은 가능하나, 제한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가 지연되거나 생장 환경이 저해될 때 적합하며,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적 복원보다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Meli et al., 2017). 열대림 복원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조적 자연복원은 생물다양성, 종조성, 생물량 등의 회복 성과가 적극적 복원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능가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Crouzeilles et al., 2017), 특히 잔존 모수(母樹)의 존재와 경관 연결성이 높은 지역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Chazdon, 2008). 반면, ‘적극적 복원’은 자생 회복이 극히 어려운 심각한 훼손지에서 적용되는 유형으로, 식생 피복이 전혀 없거나 토양이 심하게 퇴화한 환경에서 토양개량, 수종 선발 및 식재, 인공 구조물 설치 등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기술적 개입을 수반한다 (Stanturf et al., 2014). 도시 나지, 폐광지, 초지화된 고산지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종자의 외부 도입, 고밀도 식재, 기반수종(framework species)7) 도입 등 다양한 생태공학적 기법이 활용된다.
이처럼 복원유형은 고정된 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생태적 조건과 복원목표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복원유형 간 경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병행 적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Hobbs and Harris, 2001). 복원전략 설계 시에는 대상지의 훼손 상태, 자생 종자 존재 여부, 경관 내 위치, 사회적 수용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Holl and Aide, 2011), 이때 복원 유형은 단순한 기술 분류를 넘어 복원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틀로 기능한다. 따라서 생태계 복원의 유형 구분은 개념적 이론과 실천적 전략을 연결하는 교량 구실을 하며, 복원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실천적 판단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지의 훼손등급에 따른 복원유형 및 기법의 설정은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복원은 대상지의 식생구조, 천이단계, 그리고 교목성 상록 활엽수의 출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훼손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복원유형 및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Park et al. (2021)은 식생 발달단계와 출현 종 수 등 훼손등급을 기준으로 보존형, 유도형, 개량형, 조성형으로 구분되는 복원유형을 제시했으며, 각 유형은 인위적 개입의 강도, 식재 전략, 관리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Table 1).
‘보존형’은 난온대림의 극상림(climax) 또는 성숙림(mature)에 해당하며, 교목층 내 난온대 수종의 상대우점치가 90% 이상을 나타내어 생태적 안정성과 자연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적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대상지는 완도 주도와 같은 천연기념물 보호림이 대표적이며, 복원 대상이라 기보다는 참조생태계로 간주한다. 주목할 점은 대규모 복원 대상지에서도 성숙림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면 해당 구역은 보존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존형에서는 인위적인 식재나 제거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비간섭적인 보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며, 외래종 침입, 탐방객 유입, 기후 스트레스 등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탐방 목적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책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탐방로 외 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존형은 장기적으로 식생 동태 연구의 기준점 구실을 하며, 자연 천이의 방향성과 속도를 측정하는 참조생태 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도형’은 자연천이가 극상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교목성 상록활엽수종의 출현이 활발하고 비교적 높은 회복력을 보이는 발달단계 또는 천이단계의 산림에 적용된다. 1970년대 이후 도서지역에서는 곰솔림 또는 낙엽활엽수림의 하층에서 종자 산포력이 강한 후박나무, 참식나무, 생달나무 등이 성장하여 교목층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세력은 아직 미약한 상태로 평가된다(Park et al., 2021;Kang et al., 2022). 유도형은 이러한 상록활엽수종의 세력 확장과 천이 유도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교목층 내 곰솔, 낙엽성 참나무류, 낙엽활엽수 등 경쟁 수종에 대한 솎아베기 또는 방해목 제거를 통해 상록활엽수종의 수관층 우점화를 유도한다. 더불어 임상 내 광환경 개선을 통해 하층 생장 기반을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 수하식재를 병행하여 생육 촉진을 도모한다. 수관층의 임상 개방률은 50∽60% 수준으로 조정하며, 광량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경쟁 초종의 우점 또는 치수 생육 부진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 및 입목밀도 수준은 대상지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개량형’은 도서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곰솔림, 낙엽활엽수림 등 퇴행천이 식생을 대상으로 하며, 난온대 수 종의 상대우점치가 0∽50%이고, 교목성 상록활엽수 출현 종 수가 4종 미만인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은 교목층의 자생 상록활엽수종 비율이 낮고, 하층에는 사스레피나무, 돈나무, 광나무 등이 우점해 자생적 천이 회복 가능성이 낮은 구간에 적용된다. 주요 복원기법은 기존 교목층의 일부를 존치한 채 하층 식생을 제거하고, 복원목표식생 수종을 하층에 수하식재(under planting)하는 것이다. 난온대 수 종은 음수성이 강하여 햇볕에 직접 노출된 조림지에서 피압을 받아 고사하기 쉬우므로, 수관층을 일정 부분 유지한 상태에서 광환경이 조절된 하층에 식재하는 방식이 생육에 유리하다. 수관층의 임상 개방률은 50∽60% 수준이 적정하며, 해안가 또는 능선과 같이 강풍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더 낮은 개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지의 입지 환경에 따라 후박나무림형, 잣밤나무류림형, 가시나무류 림형으로 복원 목표식생을 설정하고, 유형별 주수종의 식재 비율을 50%로 설정하며, 나머지는 다양한 동반수종을 함께 심어 종다양성을 증진시킨다(Table 2). Park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에서는 100㎡당 평균 9종의 상록활엽수종이 출현했으며, 이 중 교목성 수종은 평균 4종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2(도서지역 산림복원 실무매뉴얼[2022] 수정 인용)에서 제안한 복원 수종 조성은 주수종과 동반수종을 포함하여 4종에서 최대 9종 내외로 선정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복원 초기에는 수고 0.6∼1m 미만의 유묘를 중심으로 1헥타르당 3,000∼5,000주의 밀도로 식재하되, 해당 밀도는 입지환경, 사후관리 가능성, 천이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식재 후에는 초기 성장기와 안정기로 구분하여 보식, 천이초기종의 제거, 방해목 솎아베기 등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벌채 부산물(가지, 벌채목 등)은 폐기하지 않고 현지에서 우드칩으로 재활용하거나 통나무쌓기 방식으로 처리하여 서식처 기능을 겸한 생태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토양 조건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개량보다 식재구덩이 중심의 국지적 토양개량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유형의 전략 핵심은 초기 단계에서 교목층을 조기에 형성함으로써 식생구조의 재편과 생태계 천이 촉진을 유도하는 데 있다.
‘조성형’은 초지, 산불지, 묵밭, 나지 등 산림 식생이 없거나 생태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극단적인 퇴행지에 적용된다. 이 유형은 생태계의 자생적인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Han and Park(2022)이 제시한 자연림 모듈군락식재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은 참조 생태계의 식생구조와 종조성을 모방하여, 고밀도 다종식재, 모듈 단위로 식재함으로써 조기에 수관층 형성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식재밀도는 1헥타르 당 10,000주(1주/㎡)를 기준으로 하며, 해풍 등 환경 스트레스가 심한 해안가의 경우에는 1헥타르당 20,000주로 밀도를 높여 식재 활착률을 높인다. 식재 시 주수종(Dominant species)은 50%로 구성하고, 동반수종(Companion species) 을 50%로 혼합하여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 스트레스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주수종과 동반수종의 비율을 낮추고 기반수종(Framework species)을 10∽20% 범위에서 혼합 식재하여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식재 묘목으로는 수고 0.6∽1m(2∽3년생) 컨테이너 묘를 사용하며, 초기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1.0∽1.5m의 토심 확보, 멀칭, 관수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식재 시기는 강우량이 풍부한 장마철이 가장 적절하며, 강우 직후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방목 가축 및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 방풍책 설치 등의 물리적인 방어 조치를 병행한다. 식재기반의 토양은 상층(깊이 0.6m)을 한국조경학회 기준의 ‘상급’, 하층을 ‘중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장 토양 활용, 새집 공법, 지주목 설치 등을 통해 복원 수종의 활착을 유도한다.
이러한 네 가지 복원유형 및 기법은 난온대림의 훼손 특성과 입지 조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계층적 개입 전략으로, 보존 가치의 유지부터 적극적인 식생 조성에 이르기까지 복원 스펙트럼 전반을 포괄하는 틀을 제공한다. 각 유형은 대상지의 생태적 상태뿐만 아니라, 복원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장기적인 관리계획,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난온대림 복원의 생태적 효과성과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동시적으로 제고하는 핵심 실행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