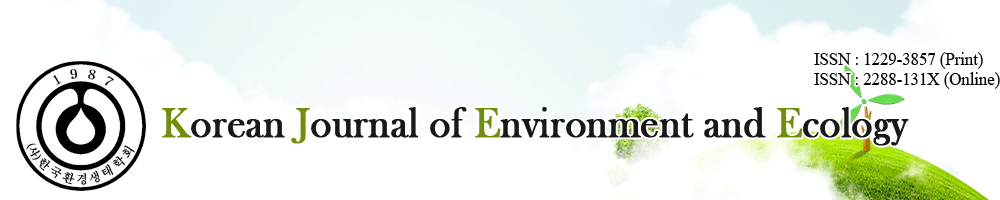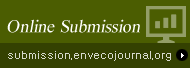서 론
전 세계적으로 토지피복 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많은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Bailey et al. 2016). 보호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발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Rodrigues and Cazalis, 2020),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Ghoddousi et al., 2022). 하지만 다수의 보호지역은 지정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호지역 내부의 개발압력이 외부와 비슷하거나(Leverington et at. 2010), 보호지역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소재 (Liu et. al, 2022;Huang et. al, 2024),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지역의 기능을 상실하는(Lee, 2011) 등의 문제들 때문이다.
보호지역의 문제로 첫째, 보호지역 내부에서 외부와 비슷한 수준의 개발압력이 일어난다. 현재 많은 보호지역이 지정 및 변경,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 없이 안내표지 설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리 미흡으로 보호지역 내·외부에서 개발이 진행되어도 통제가 어렵다(Lee, 2011). 보호지역 외부에서 토지피복 변화율과 시가화지역 면적 비율이 내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개발압력이 크다 (de la Fuente et al., 2020). 이러한 보호지역 주변 토지피복 변화는 보호지역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Hamilton et al., 2013;Guerra et al., 2019)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지역의 중복지정과 관련하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의 범주가 다양해지면서 보호지역 간의 중복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 보호지역의 약 25%가 두 개 이상의 보호지역 범주에 속해있다(Wu et al., 2020).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기능적, 공간적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보호지역의 중복지정은 보호지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Cho and Lee, 2010;Lee et al., 2013;Kil et al., 2014), 관리기관별 책임소재, 권한 분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iu et. al, 2022;Huang et. al, 2024).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지역의 기능을 상실하는 보호지역이 있다. 보호지역의 개발압력은 지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지정된 보호지역일수록 시가화지역의 면적이 작고, 개발압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시가화지역 면적의 증가율도 낮다(de la Fuente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지역의 명칭 변경으로 당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경우가 다수이며, 자료가 오래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 근거가 없어지거나 보호지역의 기능이 상실하 는(Lee, 2011)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지역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호지역의 관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Ghoddousi et al., 2022).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지 평가하는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MEE,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와 야생동물 개체수 변화, 출현종, 침입종 조사 등 현장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Rodrigues and Cazalis, 2020)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MEE는 주로 보호지역 관리자나 이해관계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Cook et al., 2014),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대규모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반해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보호지역의 효과성 평가는 생태적 지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주관적인 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 변화는 개발압력에 의한 중요한 환경변화이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Martinuzzi et al., 2015;Wilson et al., 2015;Koo and Park, 2020;Wolf et al. 2023) 보호지역 효과성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 토지피복 변화분석은 공간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러 대상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보호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를 확인할 (Smith et al., 2024)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에 반해 종풍부도, 개체군 규모, 식물 생산성 등을 이용한(dos Santos Ribas et al., 2020;Feng et al., 2021) 보호지역 효과성 평가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동시에 여러 보호지역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Smith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변화를 이용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타 보호지역과의 중복지정 여부에 따라 토지피복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기에 따라 토지피복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변 영향 또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이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의 모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과거 조수보호구를 계승한 보호지역으로, 계승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구역이 존재하며, 도로, 송전선로, 전철 개발 등 꾸준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Cho and Lee, 2010).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타 보호구역에 비해 면적이 작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지닌 야생생물 보호구역 개별 면적은 작으나, 적절한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생물종 서식지 간 연결, 타 보호구역 간의 완충 지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한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보호구역의 외부는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면적이며, 실제 보호구역은 제외하였다(Figure 1-b). 이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거리가 가까운 보호지역이 많아 1km 이상일 경우 다른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2. 자료 수집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주변 환경변화 분석을 위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대분류 토지피복도 자료를 사용했다. 토지피복도는 공간해상도 30m의 자료로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에서 취득하였다. 토지피복도 중분류와 세분류는 각각 2000년, 2010년에 제작되어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 복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간자료는 한국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KDPA)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에서 수집하였다. 수집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간자료의 경우 하나의 보호구역임에도 여러 보호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Figure 1-b), 인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간주하였고 총 281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정리하였다. 지정 시기별 보호구역의 수는 1980년대는 23개, 1990년대는 61개, 2000년대는 108개, 2010년대는 11개이고, 지정 연도가 없는 보호구역이 12개이다. 보호구역이 지정된 시기는 1980년대는 1985년에서 1989년 사이, 1990년대는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2000년대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2010년대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변화 분석의 정확성 향상과 과대 추정 및 데이터 오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일부 보호구역을 제외하였다. 첫째,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토지피복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제외하였다. 둘째, 면적이 0.05㎢ 이하인 야생생물 보호 구역을 제외하였다. 면적이 작을 경우, 해당 격자 내에 다른 토지피복이 있음에도 하나의 격자로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어 과대 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셋째, 토지피복 오류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 내부에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와 2010년대 토지피복도에는 저수지가 표현되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토지피복도에서는 저수지가 누락되어 있다(Figure 2). 해당 기준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제외한 결과, 총 215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 토지피복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 지역에 대하여 과거 자연지역이 농업지역 또는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한 면적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자연지역은 대분류 토지피복도 기준으로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ArcGIS 10.5의 분석 도구인 Tabulate Area를 사용하여 과거의 자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피복 유형이 현재 농업/시가화건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피복 유형으로 변화한 격자의 수를 구한 후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변화율 계산식은 (1)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 분석을 위해 1980년대의 자연지역에서 2010년대에 농업지역 또는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 분석을 위해 타 보호지역과 중첩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확인하였다. ArcGIS 10.5의 select by location 도구를 이용하여 215개의 분석 대상지의 중심점이 KDPA에 등록된 타 보호지역에 내에 위치한 것을 중복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타 보호지역과 중복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수는 86개, 중복지정되지 않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129개이다. 토지피복 변화는 각 보호구역의 외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8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타 보호지역과의 중복 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80% 이상이었으며, 평균은 93.91%로 타 보호지역과의 중복 비율이 높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중복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중복지정되지 않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도 타 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중복되지 않은 경우의 중복 면적 비율의 평균은 25.29%이다.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변화 분석에서는 보호구역의 외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보호구역 내외부 분석 결과 내부에서는 변화율이 0%에 가까워 보호구역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따라 그리고, 중복지정 여부에 따라 1980년대에서 2010년대로의 토지피복 변화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Shapiro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내부 및 외부,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분석 둘 다 정규성을 따르지 않아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맨-휘트니 U 검정은 두 집단의 중앙값을 비교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집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맨-휘트니 U 검정에서 0 값의 비율이 높을 경우 평균이 더 높게 나오거나 등순위(tied ranks)가 발생하여 실제 평균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 값이 많은 데이터 세트의 경우 0 값을 제외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하지만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관리와 규제가 엄격하여 대부분의 보호구역 내부는 변화율이 낮거나 0%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0%는 보호구역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율이 0%인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내부 및 외부 분석과 중복지정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1980년대에서 2010년대의 토지피복 변화율이고, 독립 변수는 각각 내부 및 외부, 중복지정 유무이다. 유의확률 5%를 적용하였으며, R version 4.3.2를 이용하였다.
지정 시기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은 제외하였다. 첫째, 215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지정 시기가 제공되지 않은 보호구역을 제외하였다. 둘째, 2010년대에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제외하였다. 2010년대에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전후의 토지피복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총 203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외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자연지역에서 각각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농업지역 및 시가화건조지 역으로 변화한 비율을 확인하였다. 지정 시기별 분석 또한 보호구역 내부의 변화율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만을 대상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 토지피복 변화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지역으로의 평균 변화율은 내부(2.41%)보다 외부(7.19%)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대 변화율 또한 내부(25.39%)와 외부(65.82%)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a, Table 1).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평균 변화율 또한 내부(0.78%)보다 외부(2.98%)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호구역 내부 변화율의 중앙값은 0%이며, 대부분이 0%에 가깝게 나타났다 (Figure 3-b, Table 1). 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 농업지역과 시가화건조 지역 둘 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무단출입, 건축물 설치, 개발 행위 등의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야생생물법, 2025) 보호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시가화 지역이나 농업지역으로의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시가화지역 면적이 작고 변화 또한 적게 나타나지만,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시가화 면적이 넓고 변화 또한 많이 일어나며, 농경지로의 토지피복 변화도 종종 일어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uerra et al., 2019;de la Fuente et al., 2020;Tarantino et al. 2023).
2. 타 보호지역과의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
타 보호지역과의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복지정 여부에 따라 토지피복 변화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지역으로의 평균 변화율은 중복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4.34%)보다 중복지정되지 않은 야생생물 보호구역(9.09%)이 토지피복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4-a, Table 2).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변화 또한 중복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1.27%)보다 중복지정되지 않은 야생생물 보호구역(4.13%)이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4-b, Table 2). 통계분석 결과 농업지역, 시가화 건조지역으로의 변화율 둘 다 중복지정 여부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또한 중복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토지피복 변화율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Table 3).
보호지역의 중복지정은 각 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질 수 있다(Huang et. al, 2024). 이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호지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Liu et. al, 202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중복지정된 보호지역에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호지역의 중복지정이 보호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기별 토지피복 변화
농업지역으로의 변화율은 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서 대부분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0~15%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1980년대에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대부분 0~15%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30% 이상인 경우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지정된 보호구역도 0~15%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에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61개의 보호구역 중 14개가 15~45%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모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0~15% 구간에 분포하며 토지피복 변화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지정된 보호구역 또한 지정 시기 이전에 변화율이 큰 보호구역이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변화율이 낮은 구간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5-a, Table 4-a).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변화율 또한 농업지역으로의 변화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 걸쳐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가장 낮은 변화율 구간인 0~5%에 분포하고 있다. 1980년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모든 시기에서 23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모두가 가장 낮은 구간인 0~5%에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이후 변화율이 5% 이상인 보호구역의 수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ure 5-b, Table 4-b).
이러한 변화는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보호구역 주변에서 개발압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국 토지피복도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국 토지피복도의 시가화건 조지역 시계열 변화 면적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1,327㎢,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696㎢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1,4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환경부, 2018). 이러한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변화율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국가 토지피복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지정된 이후 자연지역이 농업지역이나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이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압력과 생태계 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Feng et al., 2022;Tarantino et al. 2023). 또한 과거에 지정된 보호구역일수록 최근에 지정된 보호구역보다 시가화지역의 면적이 작았으며, 개발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가화지역의 증가율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e la Fuente et al., 202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피복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구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피복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호구역 외부에서 농업지역으로의 변화율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변화율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보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지만, 보호구역 외부에서는 개발압력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보호지역과 중복지정된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피복 변화가 적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보호구역 지정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피복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림, 습지 등은 대다수 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오랜 기간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토지피복 변화는 서식지의 질과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Ndegwa Mundia and Murayama, 2009; Chettri et al., 2018; Sharma et al., 2018). 이처럼 토지피복 변화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Guerra et al., 2019), 토지피복 변화만으로 보호구역의 지정이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호지역 효과성 평가 시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압력정도, 관리 역량, 종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Eklund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토지피복 자료의 경우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2000년대 토지피복도에서 시가화지역은 과소평가, 농업지역은 과대 평가되었다(Park and Kim, 2014). 둘째, 전북 고창면에 위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 내부임에도 농업 지역으로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와 2010년대 토지피복도에는 보호구역 내부에 위치한 저수지가 표현되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토지피복도에서는 저수지가 누락되어 과대 추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Figure 2). 셋째, 국가에서 제공되는 토지피복도는 해당 시기의 전체 토지피복을 반영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시기별로 2년간의 데이터만 이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고 있어 자세한 보호구역의 변화 확인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제적이고 장기적 변화 파악이 가능한 토지피복을 이용하여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토지피복 자료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수준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피복은 인간의 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토지피복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보호지역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한다면 보호지역의 효과나 보호지역에 대한 압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토지피복 변화뿐만이 아니라 개발압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도 함께 평가한다면 보호지역의 효과성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